대법 "'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대령, 국가 배상 청구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전역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시효 따져야"

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소멸 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황 전 대령은 이 일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20일 전역 처분됐다.
그는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무효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우선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는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전 대령에 대해서도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그때(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후)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여의도 문법 파괴자' 이준석…이번엔 지하철서 숙면 포착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53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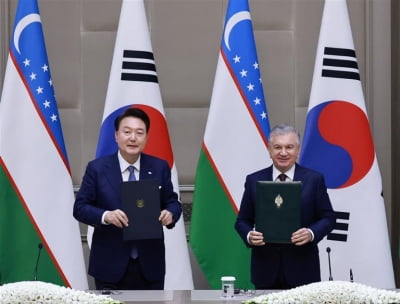












![[신간] 이더리움의 탄생 비화…'이더리움 억만장자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4147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