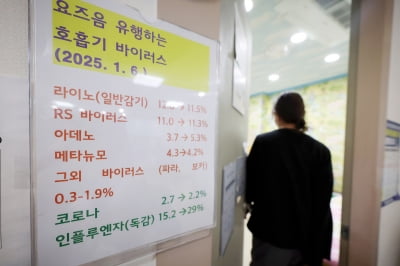사상계 前편집장 "다 잊고 훨훨 떠나길"…나태주 "쇄빙선 같았던 분"

소설가 김훈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고인이 1991년 5월 조선일보에 쓴 칼럼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원제 :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먼저 언급했다.
당시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에 맞아 숨지자 이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이 잇따르던 시절이었다.
생명사상을 강조하던 고인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민주화 시위를 '저주의 굿판'에 비유하며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소름 끼치는 의사 굿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고인은 진보 진영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김훈은 "이 칼럼은 학생들의 저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다.
주된 흐름은 죽음을 만류한 것"이라면서도 "운동권에 의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국에 대한 감수성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권에서는 이 칼럼을 크게 받아들여 당시 반(反) 김지하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그 일이 김지하 선생 입장에서도 평생의 상처가 됐고 한국 정신사에서도 갈등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척분'(滌焚·불사른 것을 씻어냄)이라는 고인의 시를 언급했다.
'스물이면/혹/나 또한 잘못 갔으리/품안에 와 있으라/옛 휘파람 불어주리니, 모란 위 사경(四更) 첫이슬 받으라/수이/삼도천(三途川) 건너라'는 내용의 짧은 시다.
고인은 칼럼 이후 논란이 커지자 이 시를 썼다고 한다.
김훈은 "죽은 원혼들을 달래는 짧은 시인데 시국 속에 매몰돼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그때는 이 시의 메시지를 경청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하의 생애에 관련해서는 이 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 시대의 갈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생은 말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하셨다"며 "본인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시 '척분'처럼 첫 이슬을 받고 쉬이 삼도천을 건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학생 때부터 잘 아는 사이인데 대단히 총명하고 용기 있었던 사람"이라며 "칼럼 논란으로 변절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운했던 사이이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회고했다.
소설가 황석영은 "1970년대 유신 독재 하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등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며 "또래이자 반세기 이상 같이 지낸 친구이고 여러 현장에서 문화 운동도 같이하며 생각과 뜻이 같았다"고 말했다.
또 "오랜 옥살이로 고문 내지 후유증을 앓았는데 우리 사회가 아픈 사람을 잘 보살피지 못했다"며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시인을 이용하기만 한 측면도 있다.
사회와 불화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돼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태주 시인은 "바다 위 빙하를 뚫고 나가는 쇄빙선 같은 분이었다"며 "앞에 서서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삶이었다.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불행하고 힘들며 고달팠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낸 뒤 칼을 내려놓고 눈을 감은 장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