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준 시인 "자연에서 받아쓴 시, 서정의 변화 들어있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문집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시집 '아침은 생각한다' 펴내

문태준(52) 시인이 산문집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마음의숲)와 4년 만의 시집 '아침은 생각한다'(창비)를 함께 펴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를 나눈 산문집에는 꽃, 풀, 새 등 자연의 순리에 기댄 시인의 섬세한 사유가 온화하게 그려진다.
공들여 길어낸 문장들은 바깥세상에 몰입해 마음과 마주할 겨를 없는 우리에게 고즈넉한 쉼터가 돼준다.
시집에도 사계절이 들어있다.
모습을 바꾸는 자연 안에서 생명과 존재가 연결되고 연민과 공감이 피어난다.
시인은 누군가 옮겨 놓은 큰 돌과 그 그림자('돌과 돌 그림자')에까지 눈을 맞추고 연결된 세상을 찾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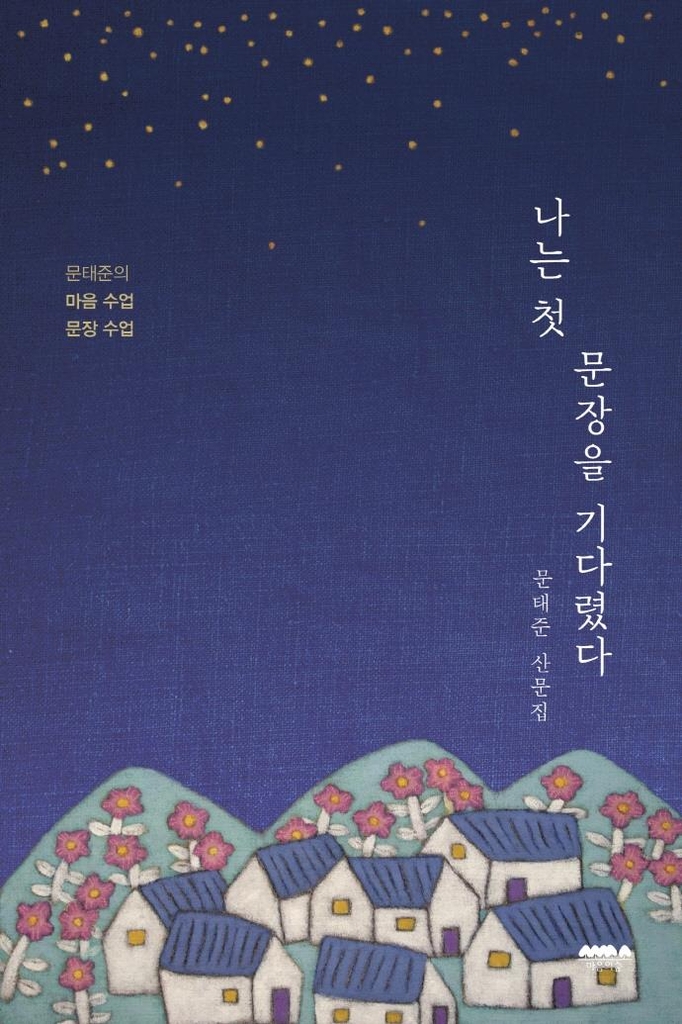
"제가 지은 시나 산문 모두 자연을 바라보는 서정의 변화가 들어있죠."
문태준 시인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 권처럼 읽히는 두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사람은 대자연 속의 작은 자연"이라며 "작은 자연인 제가 큰 자연으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 시"라고 했다.
도시에 살던 시인은 2년 전 자연의 품에 안겼다.
재작년 8월 제주 애월읍 장전리에 터를 잡았다.
귤과 한라봉 몇 그루를 일구고 텃밭의 돌을 캐고, 오름과 바람과 항구를 곁에 둔 일상은 시인의 내면을 설레게 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성장기엔 산골의 자연 속에 있었다"며 "이후 몸이 자연을 경험하는 건 지금이 두 번째다.
자연을 직접 만나고 있으니 마음의 새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가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쓴다는 그는 '내 시는 생명 세계의 살림에서 태어난 노래에 가깝다'고 여긴다.
닭이 콕콕 쏘는 수선화 싹에서('봄소식'), 새들이 몰려든 막 꽃을 피우려는 덤불에서('상춘'), 송홧가루 날려 내리듯 오는 봄비('봄비')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어린 봄'을 발견한다.
시인의 선한 서정은 대자연 안에 연결된 존재들의 더불어 사는 가치도 일깨워준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팬데믹 시대에 '갖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고집스러운 바람에도 땅속에 엉킨 꽃나무와 풀꽃의 뿌리는 '풀지 않겠다는 듯 서로를 옮겨 감'고('뿌리'), 혹한의 산속에서 고라니와 눈빛이 마주치면 '추운 한 생명이 추운 한 생명을/ 서로 가만히 고요한 쪽으로 놓아'준다.
('눈길')
새와 벌레가 남긴 '꾸지뽕 열매 반쪽을 얻어먹으며 별미를 길게 즐'기고('별미'·別味), 제주의 음식점마다 놓인 감귤 상자에서 후한 인심의 소중함을 느낀다.
그는 "자연은 생명공동체"라며 "하나의 자연 안에 다른 자연 존재가 포함되고 그런 관계가 쌓임으로써 자연과 사람의 관계, 마음의 연대, 연민과 공감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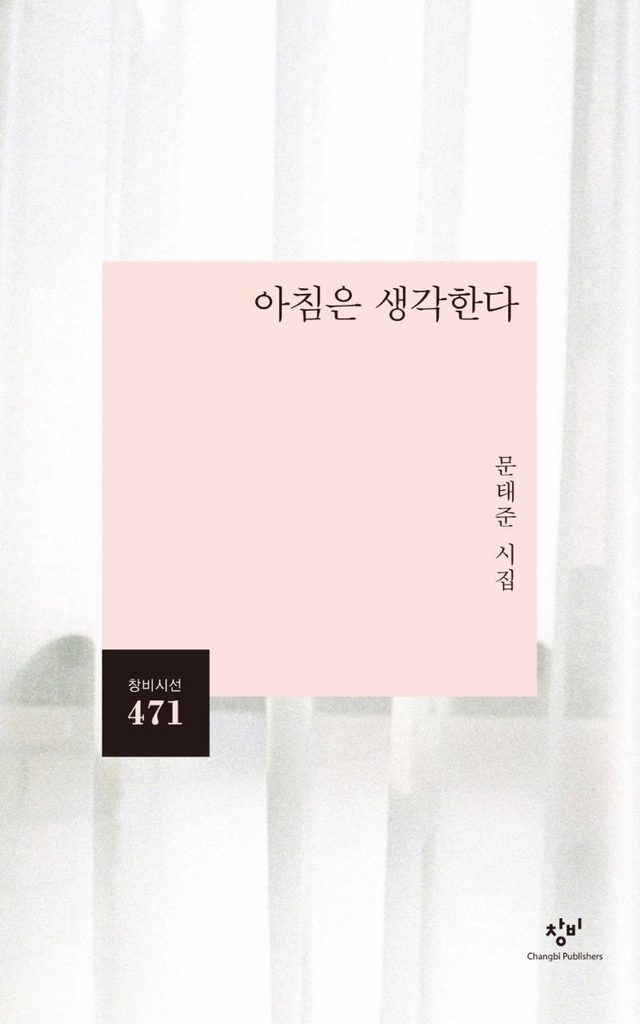
1994년 등단한 시인은 어느덧 삶의 절반 이상을 시 짓는 일로 보냈다.
소월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서정시 계보에 이름을 남겼다.
시인은 '첫 기억'이란 시에서 서너 살 무렵 누나의 작은 등에 업혀 들은 '누나의 낮은 노래'가 자신을 시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에선 이런 시들이 태어나기까지의 진통도 꺼내놓는다.
매일 글씨들이 내려앉기를, 그 첫 문장을 기다리는 시인은 '문장이 올 때 이 세상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 = 마음의숲. 280쪽. 1만6천 원.
▲ 아침은 생각한다 = 창비. 112쪽. 9천 원.
/연합뉴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를 나눈 산문집에는 꽃, 풀, 새 등 자연의 순리에 기댄 시인의 섬세한 사유가 온화하게 그려진다.
공들여 길어낸 문장들은 바깥세상에 몰입해 마음과 마주할 겨를 없는 우리에게 고즈넉한 쉼터가 돼준다.
시집에도 사계절이 들어있다.
모습을 바꾸는 자연 안에서 생명과 존재가 연결되고 연민과 공감이 피어난다.
시인은 누군가 옮겨 놓은 큰 돌과 그 그림자('돌과 돌 그림자')에까지 눈을 맞추고 연결된 세상을 찾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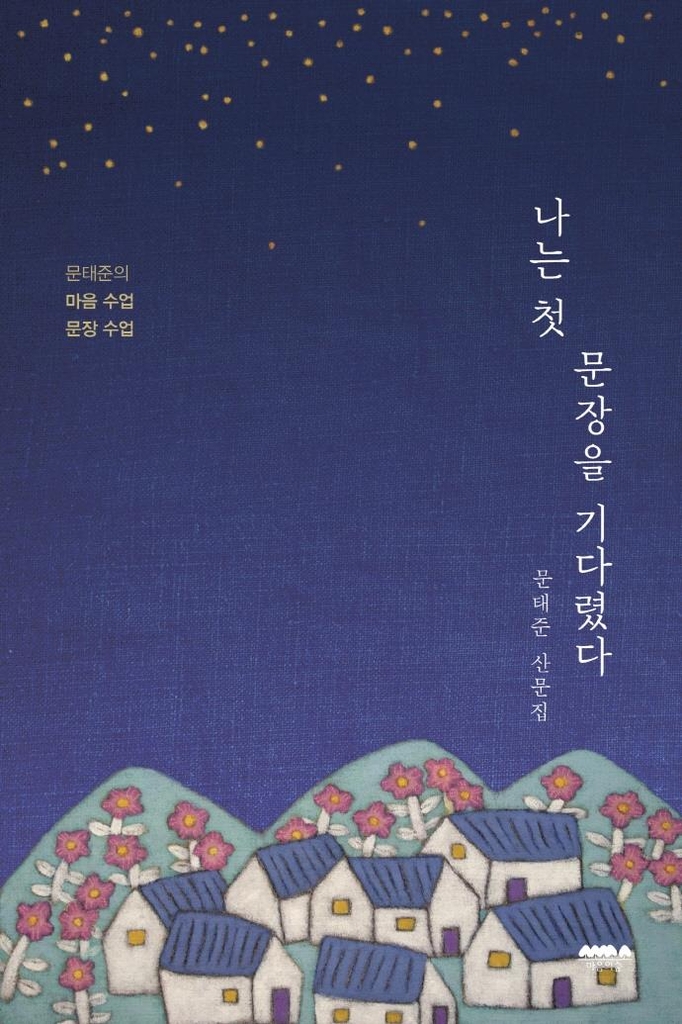
문태준 시인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 권처럼 읽히는 두 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사람은 대자연 속의 작은 자연"이라며 "작은 자연인 제가 큰 자연으로부터 받아 쓰는 것이 시"라고 했다.
도시에 살던 시인은 2년 전 자연의 품에 안겼다.
재작년 8월 제주 애월읍 장전리에 터를 잡았다.
귤과 한라봉 몇 그루를 일구고 텃밭의 돌을 캐고, 오름과 바람과 항구를 곁에 둔 일상은 시인의 내면을 설레게 했다.
경북 김천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 성장기엔 산골의 자연 속에 있었다"며 "이후 몸이 자연을 경험하는 건 지금이 두 번째다.
자연을 직접 만나고 있으니 마음의 새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가 자신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쓴다는 그는 '내 시는 생명 세계의 살림에서 태어난 노래에 가깝다'고 여긴다.
닭이 콕콕 쏘는 수선화 싹에서('봄소식'), 새들이 몰려든 막 꽃을 피우려는 덤불에서('상춘'), 송홧가루 날려 내리듯 오는 봄비('봄비')에서 생명이 꿈틀대는 '어린 봄'을 발견한다.
시인의 선한 서정은 대자연 안에 연결된 존재들의 더불어 사는 가치도 일깨워준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팬데믹 시대에 '갖고 살아야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고집스러운 바람에도 땅속에 엉킨 꽃나무와 풀꽃의 뿌리는 '풀지 않겠다는 듯 서로를 옮겨 감'고('뿌리'), 혹한의 산속에서 고라니와 눈빛이 마주치면 '추운 한 생명이 추운 한 생명을/ 서로 가만히 고요한 쪽으로 놓아'준다.
('눈길')
새와 벌레가 남긴 '꾸지뽕 열매 반쪽을 얻어먹으며 별미를 길게 즐'기고('별미'·別味), 제주의 음식점마다 놓인 감귤 상자에서 후한 인심의 소중함을 느낀다.
그는 "자연은 생명공동체"라며 "하나의 자연 안에 다른 자연 존재가 포함되고 그런 관계가 쌓임으로써 자연과 사람의 관계, 마음의 연대, 연민과 공감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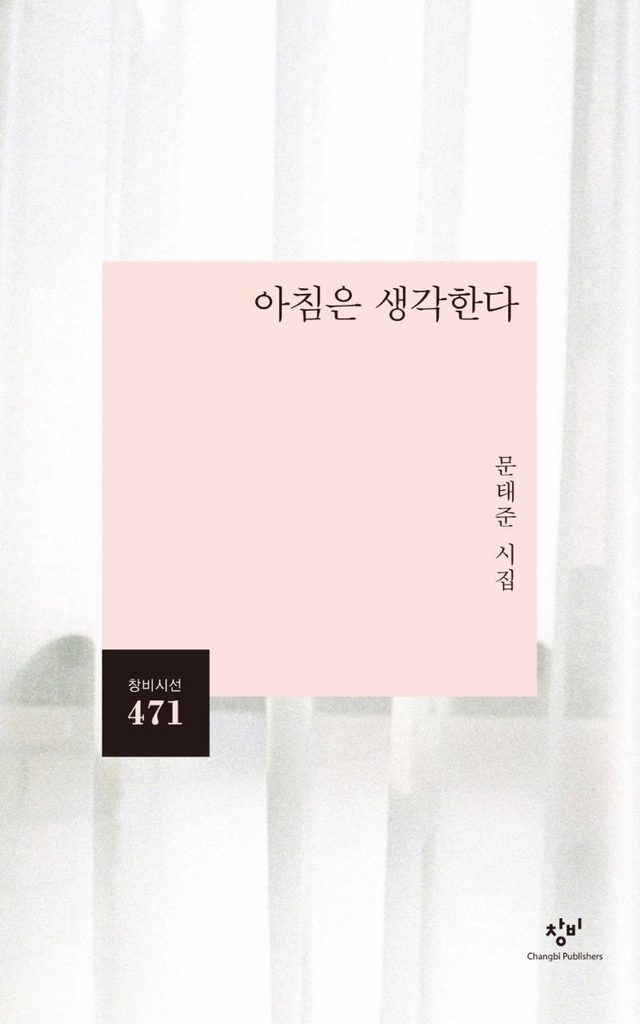
소월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서정시 계보에 이름을 남겼다.
시인은 '첫 기억'이란 시에서 서너 살 무렵 누나의 작은 등에 업혀 들은 '누나의 낮은 노래'가 자신을 시의 세계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산문집에선 이런 시들이 태어나기까지의 진통도 꺼내놓는다.
매일 글씨들이 내려앉기를, 그 첫 문장을 기다리는 시인은 '문장이 올 때 이 세상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 = 마음의숲. 280쪽. 1만6천 원.
▲ 아침은 생각한다 = 창비. 112쪽. 9천 원.
/연합뉴스


![참가비 25만원…30대 강남 주부들 '우르르' 몰린 이유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9923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