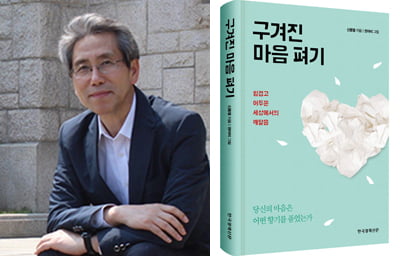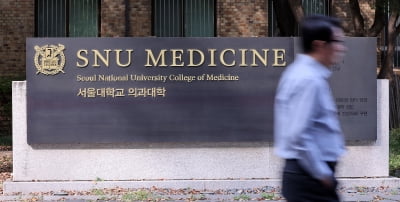춘추시대 월나라와 오나라는 말 그대로 ‘앙숙’이었다. 두 나라는 치열하게 싸웠고, 간혹 화친을 맺어 서로 후일을 도모했다. 오왕 부차가 다리에 중상을 입으면서 아버지 합려를 죽인 월왕 구천과의 복수전에서 승리했다. 원래 전쟁이란 게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한 ‘중간 승리’인 경우가 많다. 이 싸움 또한 그러했다.
월나라 대부 종(種)이 구천에게 오나라와 화친을 맺으라고 간했다. 구천은 이를 받아들여 대부 제계영에게 오나라에 가서 화평을 청하도록 했고, 이로써 싸움은 잠시 멈췄다. 앞서 부차는 아버지를 죽게 한 월나라를 널리 용서한다며 말했다. “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백골에 살을 붙이는 것과 같다.(起死人而肉白骨也)” 부차는 더 처절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검을 깊이 숨겼다.
진나라 정치가 여불위가 빈객(賓客) 3천 여명을 모아 편록(編錄)한《여씨춘추》별류편에는 노나라 사람 공손작 얘기가 나온다.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我可活死人也)”며 큰 소리를 치고 다녔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으니 그가 답했다. “나는 반신불수를 고치는데 그 약을 두 배로 늘리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起死回生)”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여럿 모이면 그 중에는 꼭 허풍치는 사람이 있다. 암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기사회생(起死回生)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관중은 최선을 다한 꼴찌에게 박수를 보낸다. ‘최선’의 의미를 아는 까닭이다. 기사회생으로 승패를 뒤집은 선수에겐 더 큰 박수를 보낸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자신을 이겨내는 의지, 경기장을 적시는 땀이 없이는 기사회생이 불가능함을 아는 까닭이다. 뒤집기 한판, 그건 단순한 기술 이상이다. 그건 갈고닦은 그 모든 것의 응집체다. 인생의 묘미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다. 하지만 조금 버겁다고 주저앉고, 두어 번 두드려도 안 열린다고 포기한다면 내일도 얼추 짐작이 된다. 쉽게 포기하는 자에겐 결코 길이 열리지 않는다.
신동열 한경닷컴 칼럼니스트/작가/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