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을 둘러보면 세 개의 빛기둥이 보인다.
빛은 퍼지지 않고 스포트라이트처럼 수직으로 낙하한다.
연기가 바닥으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빛줄기를 드러낸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예화랑에서 12일 개막한 개인전 '천 개의 바람'에서 리경은 빛을 자신의 방식대로 구성한다.
간격을 띄워 나란히 배치된 세 개의 빛줄기는 저마다 다른 주기로 켜지고 꺼진다.
세 빛기둥이 동시에 떨어지는 순간 가장 환하고, 모든 빛이 꺼지는 순간도 있다.
2년 반 전 작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만든 작업이다.
생전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작가는 서로 다른 삶의 주기를 빛에 대비시켰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아버지는 미술 작업을 하는 딸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학교에 들어갈 때도, 전시회에도 오지 않으셨다"라며 "18년간 아버지와 안 보고 지냈고, 돌아가시기 전 동생이 내 작업을 한번 보여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돌아가신 직후 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라며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했고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리경은 빛을 탐구해온 작가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문화ICT관에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과거 작업이 주로 텅 빈 공간에 빛의 연출로만 이뤄졌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 회화, 설치 작품이 어우러진다.
갤러리 1층에는 빛기둥과 함께 투명 아크릴 좌대 위에 3개의 황금빛 금속 상자를 놓았다.
상자에는 녹색, 붉은색, 푸른색의 반투명 물질이 들었다.
빛의 삼원색을 담아 오브제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2층 벽면에는 빛으로 가상의 계단을 만들었다.
여러 모양과 크기로 이뤄진 수많은 계단 이미지가 벽에 투사돼 어딘가로 올라가는 길을 낸다.
3층에는 자개로 만든 정방형 오브제들이 벽에 걸렸다.
5년 전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일본 도쿄 메종 에르메스 전시공간 바닥 150평을 자개로 깔았던 작업을 압축했다.
그동안 주로 미술관 등 대형 공간을 빛으로 해석하는 설치작업을 해온 작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갤러리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많은 고민도 했지만 재미있는 도전이었다"라며 "지금까지 한 설치작업을 응축해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7일까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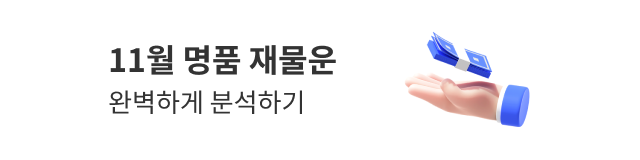


!["5일 만에 3kg 뺐어요"…다이어트 비법 '조회수 폭발' [건강!톡]](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5713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