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 이슬이 맺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 10월 8일) 즈음에 생감 수확과 곶감 만들기가 시작됐다.
껍질을 얇게 깎아낸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둥시감들이 감타래에 매달려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흔든다.
억대 부농이 많다는 상주의 풍요를 보여주는 광경이다.
◇ 사색과 성숙의 계절, 겨울과 함께 곶감이 익어요
경북 상주 곳곳에서는 요즘 주황색 예쁜 감이 시렁에 매달려 탐스럽고 고운 곶감으로 바뀌고 있다.
곶감 특구인 이곳에서 11∼12월이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큰 농가는 매달린 감의 수가 수백만 개에 이른다.
눈으로만 봐도 정겹다.
수확을 앞둔 농부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황홀할까.
큰 농가뿐 아니다.
상주에는 웬만하면 집에 감나무와 감 말리는 시렁이 있다.
늦가을이면 마당이나 평상에서 건조 중인 감말랭이, 감 깎는 손길들, 곶감이 대롱대롱 매달린 감시렁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들과 길가의 감나무 잎들이 빨갛게 물들어 노란 은행나무 가로수와 어우러지면 상주는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상주 곶감 농가는 5천500여 곳이다.
한 해 생산되는 감은 4만5천여t에 이른다.
곶감 생산량은 지난해 1만280t이었다.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다.
올해도 1만t을 넘어설 전망이다.

태풍이 있었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고 병충해도 별로 없었다.
상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연원동 '감도가곶감'에는 곶감 200만여 개가 감타래에 매달려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곳 곶감 매출은 연간 10억원가량.
상주곶감유통센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기도 한 이재훈 감도가 대표는 "올해는 날이 더워 감 당도가 높다.
잘 마르면 근래 가장 맛있는 곶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경상도'라는 이름은 '경주'의 '경'자와 '상주'의 '상'자를 따서 지었다.
상주가 경상도의 뿌리임을 입증하는 한 예다.
역사와 전통이 각별한 상주는 예로부터 '삼백(三白)의 고을'로 통했다.
삼백은 곶감, 쌀, 누에고치를 일컫는다.
그만큼 상주에서는 오래전부터 감 농사가 잘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68년 예종 즉위년에 상주곶감을 진상 품목으로 정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주 곶감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이 기록은 상주 곶감이 우리의 가장 오랜 농특산물임을 말해준다.
상주에서 곶감 농사가 잘되는 것은 무엇보다 토착종 감인 '상주둥시'가 곶감에 적합한 품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당한 기후, 500년 동안 잘 계승되고 있는 전통 생산 기술이 더해져 명품 곶감을 만들고 있다.
세계적 명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주곶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빚은 결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상주 농업인들의 열정을 명품 곶감의 비결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상주 곶감 농가의 60% 정도가 가업을 이어받았다.
대를 이어 곶감 생산에 종사하다 보니 남다른 열정과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역시 3대 곶감 농업인이다.
상주 곶감 농업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아는 멋쟁이들이라고 이 대표는 전했다.
곶감이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 적절한 보상과 생활의 여유가 가능한 것 아닌가 싶다.

곶감은 우리의 대표적인 말린 과일이자, 겨울 간식이다.
'꼬챙이에 꽂아 말린 감'이어서 곶감이라 불렀다.
요즘은 꼬챙이에 끼지 않고 주로 플라스틱 전용 걸이에 매달아 말린다.
상주에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께 감을 깎아서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고 건조시킨다.
반건시로 되는 데 50∼60일, 건시로 되는 데 60∼80일이 걸린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전후에 반건시가 출하되고, 구정쯤에 건시가 선보일 예정이다.
상주둥시는 생산량이 많고 천일건조에 유리하며, 과육의 수분, 섬유질, 점질이 건시 만들기에 적당하다.
상주둥시의 기원은 확인할 수 없으나 '하늘 아래 첫 감나무'로 불리는 상주 외남면 소은리 감나무의 수령이 약 750년이다.
상주에서 약 1천년 전부터 둥시가 재배되지 않았나 추정하는 근거다.
이 나무는 국내 최고령 감나무인데 여전히 감이 풍성하게 열린다.
올해는 약 3천여 개의 감이 열렸는데 백화점에서 개당 1만원 정도의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한다.
상주곶감은 다른 지역 곶감보다 당도가 4배 높고, 비타민 A는 7배, 비타민 C는 1.5배 많다.
혈액 응고를 막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 혈액 순환에 탁월한 스코폴리틴 성분이 들어 있다.
상주곶감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8년 대통령이 보낸 설날 선물 품목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2월 10일 남북 고위급대표단 오찬장에 후식으로 올랐다.
상주시와 농가들은 곶감의 활로를 수출로 잡고 있다.
근래 교포가 많은 미국, 한류 바람이 센 동남아시아는 물론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으로 곶감 수출이 늘고 있다.

상주에서는 사실 곶감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자연 지형, 기후 조건이 좋아 재배가 순조로운 작물이 많다.
덕분에 상주는 국내 최대 농업도시, 도농복합도시다.
연중 내내 새 작물이 끊이지 않고 출하된다.
1월에 곶감, 2월에 딸기, 3월에 참외, 4∼5월에 블루베리, 6∼7월에 복숭아, 가을엔 포도·배가 새로 나온다.
곶감뿐 아니라 꿀, 오이, 육계, 한우 등이 전국 1위 농축특산물이다.
상주는 소백산맥이 뻗어있고, 강원도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처음으로 큰 본류를 형성하는 곳이다.
낙동강변에는 기름진 땅이 넓은 들을 형성하고 있다.
기후도 농사에 적합하다.
땅, 물, 기후 삼박자가 맞는 셈인데 인심도 후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상주는 귀농, 귀촌이 활발해 '귀농귀촌 1번지'로 통한다.
농업이 잘 되고, 귀농귀촌 지원 인프라와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인 것 같다.
땅값도 싼 편이다.
귀농귀촌 인구는 지난해 1천377가구, 1천728명이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8천164가구, 1만922명이 귀농귀촌했다.

유기농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벼농사를 짓는 한편 피자와 수제 맥주 만들기 체험 카페 '살롱 드 봉강'을 운영한다.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은 물론 퇴비조차 쓰지 않는 자연 농사로 수확한 쌀은 소출이 적지만 맛이 뛰어나 수요를 대지 못하고 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자연 농사를 포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벼농사와 카페 운영으로 큰돈을 벌진 못하지만 조금씩 저축하는 생활은 가능하다고 한다.
경험을 더 쌓아서 본격적인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다.
지역공동체인 상주공동체환경학교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들은 벼농사나 카페 운영이 이웃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낯선 상주에서 소외되기는커녕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한다.
◇ 경상도의 뿌리
최근 구석기 유적이 상주에서 발견됐다.
이는 영남 내륙에서 발견된 석기 시대 유적으로는 가장 오래됐다.
상주가 오래전부터 활발한 인간 활동의 무대였음을 보여준다.
상주는 신라부터 조선 시대까지 영남의 중심지였고 경상 북부의 교통요충지였다.
그러나 근·현대 들어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비껴가면서 정치, 경제 중심지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상주를 열십자(+) 모양으로 관통하면서 다시 교통망의 혜택을 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이 1시간 30분∼2시간 거리에 들어왔다.

경천대, 남장사, 문장대 등 유서 깊은 명승지가 곳곳에 있고 성주봉휴양림, 자전거박물관 등 문화, 휴식 공간이 다양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전거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상주는 자전거 타기 좋은 평야 지대이고, 자전거 인구가 많다.
곶감이 익고 있는 상주에서는 지금, 느릿하게 흐르는 낙동강변의 깊어가는 늦가을과 다가오는 겨울 사이를 자전거로 가르는 넉넉한 마음을 만날 수 있다.
※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월간 '연합이매진' 2019년 1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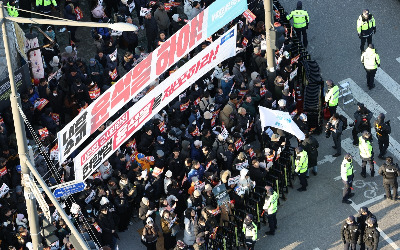
![[책마을] 이해할 수 없으면 가족이 될 수 없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62118.3.jpg)
![[책마을] 꾸밈도, 요란함도, 반성도 없다…메르켈 똑 닮은 메르켈 회고록](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85951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