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근대화론은 한국 근대화의 실질적 시발점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다.
각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친다.
통상 식민지근대화론 대척점에는 일제 수탈을 강조하는 내재적 발전론이 있다고 본다.
신간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근대화론'은 제목 그대로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도리우미 유타카(鳥海豊) 한국역사연구소 상임연구원이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이 공업 발전을 경계했다고 분석한다.
그는 "일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을 발전시키려고 했다면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 정부처럼 많은 관영 공장을 건설해 민간에 불하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인프라 정비, 즉 토목공사에 편중해 조선 경제에 진력했다는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특히 조선총독부가 1930년에 작성한 통계 중에서 우편저금 잔고에 주목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인구의 2.45%인 일본인이 저금액 86%를 보유했다.
1인당 저금액은 일본인이 56.46엔, 조선인이 0.23엔이었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론 논문 중에는 인구가 아주 적은 일본인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배분됐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 한 사람이 조선인 245명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일본 측에서 만든 다양한 자료를 조사한 저자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수탈'이라는 개념으로 반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조선총독부가 입찰 자격을 제한해 조선인 참여를 억제한 행위를 수탈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각을 확대해 정치권력의 경제 영역 부당 관여와 개입,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당한 방치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구조적 폭력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식산업사. 298쪽.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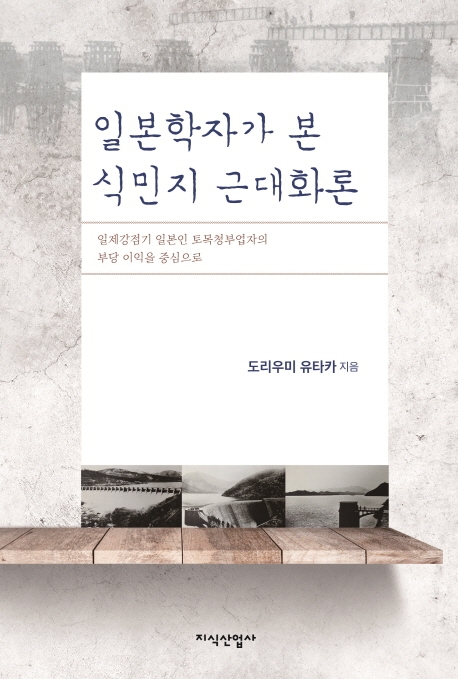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