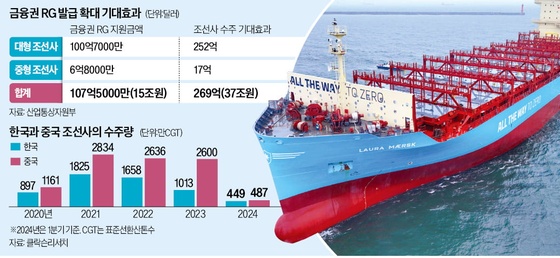中, 北 핵실험시 송유관 밸브 잠글까…"中, 득보다 실 많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기간 차단하면 원유 굳어 막혀…재개통에 비용·시간 소요
中, 연간 30만t 원유 공급…北, 러시아 등 원유 수입선 다변화
중국 내부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중국의 원유지원 중단 문제는 그간 북한 도발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고 이번에는 관영매체까지 가세해 6차 핵실험으로 실제 송유관 밸브가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은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과 랴오닝(遼寧)성 푸순(撫順) 등에서 생산한 원유를 단둥시의 바싼(八三) 유류저장소에 보관했다가 지름 377㎜, 길이 30여㎞의 송유관을 통해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리의 봉화화학공장으로 보낸다.
바싼 유류저장소에서 15㎞ 정도 떨어진 압록강 변의 마스(馬市)라는 가압시설에서 펌프를 가동, 압록강 하저에 매설된 송유관을 통해 원유 가공공장인 봉화화학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송유관은 마오쩌둥 생존 시기인 1975년경 완공돼 북중관계가 밀접했던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1년에 최대 300만t의 원유가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일 집권 이후 중국 내부에서 원유 지원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원유 공급량은 차츰 줄어들어 김정일 사망 직전에는 연간 50만∼60만t 수준을 유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친중파로 분류되던 장성택 처형 등 여러 계기로 북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량은 더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 고위급 탈북민은 14일 "중국은 매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줄여왔다"며 "최근에는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가는 원유가 연간 30만t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중국이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원유의 일부에 대해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무상지원 양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송유관으로 공급하는 원유 중에서 5만∼6만t 정도만 무상지원이고, 나머지는 유상지원"이라며 "오히려 지금은 북한 당국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원유 대금을 최대한 중국에 지불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의 연간 유류 소비량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대북 소식통들은 100만∼150만t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30만t 정도를 중국에서 원유로 공급받아 봉화화학공장에서 가공해 사용하고 나머지 70만∼120만t 정도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휘발유 등의 가공유를 수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직은 북한이 대부분의 석유를 유조선과 유조차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원유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며 러시아 석유 수입도 늘리는 추세다.
이 때문에 중국이 송유관을 잠근다 해도 북한은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던 30만t 정도를 다른 경로로 수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에서 무상으로 받는 5만t가량의 원유가 끊기더라도 석유 소비를 그만큼 줄이거나,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여 그만한 양의 석유를 수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소식통은 "많은 사람은 마치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차단하면 북한이 바로 항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중국은 송유관을 차단했음에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송유관으로 북한 핵 문제를 굴복시킬 결정적인 지렛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중조(中-朝)우의 송유관'이란 공식 명칭에서 보듯이 송유관은 북중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꼽힌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을뿐더러 송유관을 차단하면 북중 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송유관 차단은 중국의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송유관을 쉽게 차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이유도 거론하고 있다.
중국 원유에 파라핀 성분이 많아 고온으로 가열한 뒤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데 송유관 밸브를 차단해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관 내부에 남아있던 원유와 찌꺼기들이 굳으면서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송유관을 오랫동안 잠갔다가 다시 사용하려면 관 내부에서 굳어버린 원유를 녹이는 데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완전 폐기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송유관 차단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