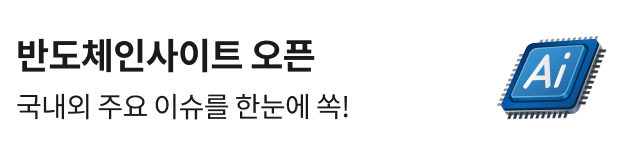시스템 운영 등 산업외연 확장
대형 해외철도사업 수주 집중해야"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

철도는 미래 산업이기도 하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도시화가 확대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철도 수요는 늘어난다. 현재 200조원 수준의 글로벌 철도시장이 10년 후 3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철도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왔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일본 히타치를 팔기 위해 이들 나라 정상은 세계무대에서 국가대항전을 펼친다. 20여년 전 프랑스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 문서 2권을 들고와서는 TGV가 선정되면 문서 전체를 반환할 수 있다고 암시했던 일은 철도 수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한국은 아직 철도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철도는 여전히 코레일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생각한다. 철도 부품업체는 종사자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가 70%이며, 완성차량 업체 규모가 부품업체보다 3배 이상 큰 역삼각형 구조여서 특정 기술을 가진 부품업체가 파산하면 이를 대체할 업체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품 공급망이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철도차량의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기술력이 보편화된 전동차 분야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누가 40여년 전에 한국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고, 누가 10여년 전에 한국이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작국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겠는가.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산업의 범주를 차량 제작에 가두지 말고 선진국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운영이나 차량 임대까지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 차량 제작산업은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 육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핵심부품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R&D)을 집중하고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우리 부품도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과 브랜드로 수출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산업을 스마트화, 융·복합화해야 한다. 글로벌 철도산업은 ‘스마트 차량’, ‘스마트 운영’, ‘스마트 유지보수’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철도 전 분야에 결합시키는 것이 트렌드다. 여기에 한국의 기회가 있다. ‘IT=한국’ 아닌가. 스마트 기술을 우리 철도산업 곳곳에 녹여 넣어야 한다.
세 번째로 공공 부문이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을 합친 철도 분야 예산이 2017년 기준 18조원에 이른다. 이제는 공공 부문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사줘야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올라간다. 철도운영이나 시설관리 분야에서도 민간의 경영 혁신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철도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해서는 도약대가 필요하다. 그 도약대는 대형 해외 철도사업 수주다. 올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330㎞를 잇는 150억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터키 내 5개 고속철 노선에 투입될 30억달러 규모의 차량 구매사업 입찰이 시작된다. 한국 최고의 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수주전략을 짜고, 정부는 뭘 지원해야 할지 고민을 더하다 보면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철도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