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과 같이 숫자로 속도 제한을 표시한 것은 1861년 ‘기관차법’과 1865년 최초의 도로교통법으로 알려진 ‘적기조례’가 제정된 이후다. 당시 최고 시속은 고속도로가 16㎞, 도심은 3㎞, 도심을 벗어난 교외는 6㎞였다. 자동차 최고 시속이 20㎞를 간신히 넘나들 때이니 제한 속도 역시 낮았다.
그러다 1896년 고속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한적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23㎞로 높아졌다. 당시 이 속도는 말(馬)이 전력 질주할 때를 고려해 결정됐다. 교통법 시행 후 속도 제한 위반으로 처음 걸린 인물은 월터 아널드였는데, 1896년 1월28일 도심을 시속 13㎞로 달려 1실링(현재 가치로 약 8000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이후 자동차 엔진의 발전에 따라 제한 속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독일 아우토반의 일부 속도 무제한 구간을 빼더라도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140㎞/h까지 허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런데 속도 제한은 언제나 논란거리다. 성능 발전과 맞지 않게 제한 속도를 낮추려는 시도가 많아서다. 일부 도시는 제한 속도를 30㎞/h로 설정할 만큼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안전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차원이지만 지나친 제한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제한 속도는 국내에서도 언제나 갑론을박하는 문제다. 2010년 여러 논쟁 끝에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10㎞/h 높였지만 성능 개선에 따른 제한 속도 상향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제한 속도를 낮출수록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기에 앞서 속도 제한 표지판만 설치해도 사상자가 상당히 감소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 등에선 도시 제한 속도를 10㎞/h 낮춰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 제한 속도 조정을 논하기에 앞서 지금 시급한 것은 준수 여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명 스쿨존 또는 실버존으로 알려진 구간에선 반드시 30㎞/h 이내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에만 427건에 달한다. 그런데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보호 구역 제한 속도를 그저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꽤 많다.
최근 세계 여러 도시에서 ‘자동차 없는 거리’ 만들기가 한창이다. 탄소배출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낮추자는 취지다. 많은 자동차 애호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안에선 ‘운전자’이지만 내리면 곧 ‘보행자’이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속도 경쟁을 벌인다. 이유는 단 하나, 그것 외에 달리 제품을 차별화할 요소가 없어서다. 하지만 속도의 시대가 저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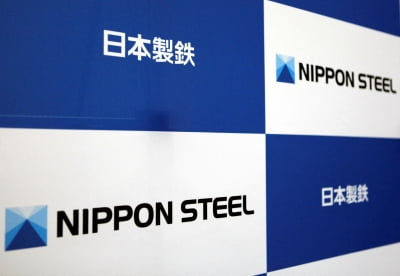
![美 경제학자의 반성…"경기 침체 때마다 금리 예측 실패" [미국경제학회 2025]](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0257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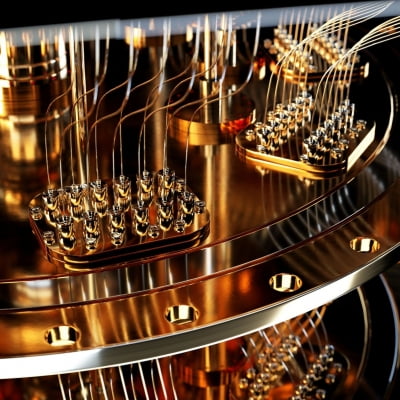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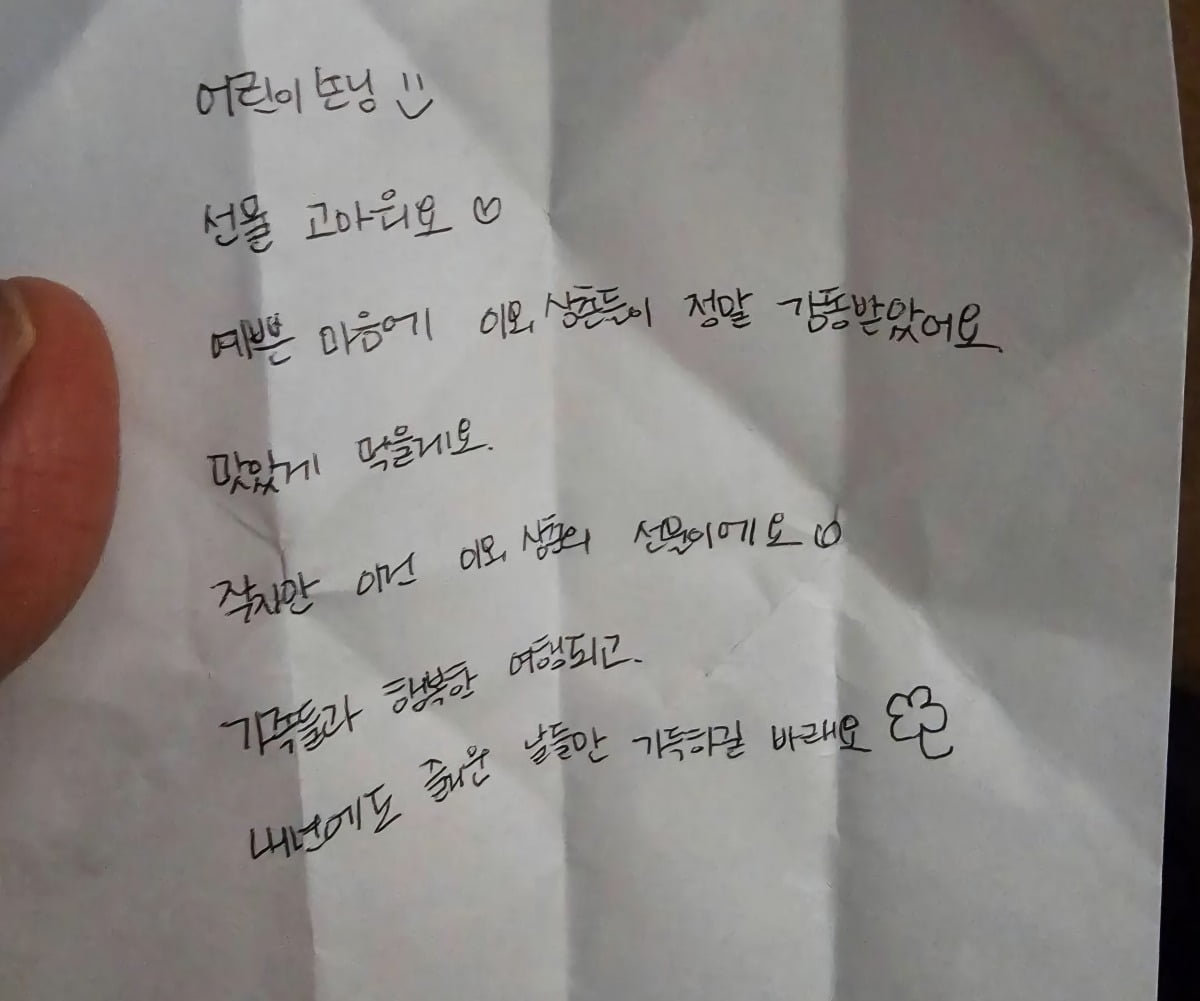
![[한경 오늘의 운세] 2025년 1월 4일 오늘의 띠별 운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764375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