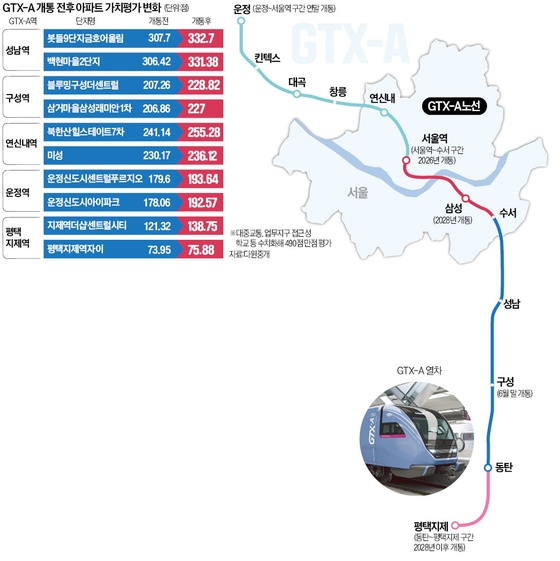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총선 D-31] '충청黨' 없는 총선…27석 중원민심 향배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14년 시도지사는 野 싹쓸이…인물·지역현안 해결능력이 변수
13일로 한달(31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은 24년 만에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 없이 치러지게 돼 충청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영남과 호남에 지역기반으로 둔 여야의 두 거대 정당이 대립하는 각종 선거에서 충청표는 대체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충청당'의 역사는 지난 1987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종필(JP) 전 총리가 충청권을 토대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해 대선에 도전했고, 1988년 13대 총선에 참여해 민정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과 함께 4당체제를 이뤘다.
그러나 1990년 민정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이 통합,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충청당'의 명백은 잠시 끊겼다.
그러다가 1995년 김 전 총리가 다시 자민련을 창당하면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다시 등장했다.
이어 자민련(15∼17대)이 자유선진당(18~19대), 통일선진당 등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지난 2012년 새누리당에 흡수 통합됐다.
충청권 정당의 '전성기'는 자민련 초기였다.
자민련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명의 당선자를 배출, 명실상부한 원내 '제3세력'이 되면서 영·호남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당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의 틈바구니에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했다.
또 1997년 대선에서는 당시 김 총재가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공동 정권을 창출하는 등 한껏 주가를 올렸다.
그러나 자민련은 16대 총선에서 17석을 얻는데 그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쪼그라들었고, 17대 총선에선 4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진당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18대 총선에서는 18석을 얻어 '부흥'을 꾀했지만, 19대 총선에서 다시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통합됐다.
지역 기반 정당이 사라진 가운데 20대 총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충청권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JP,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총재, 심대평 전 선진당 대표처럼 충청표심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물급 정치인이 없다는 점도 혼전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격전을 벌이는 충청 지역은 대전 7석, 세종 1석, 충북 8석, 충남 11석 등 총 27석이 걸렸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 분포로 볼때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다.
19대 총선 때 현재의 새누리당(새누리당+선진당)은 대전의 6석 가운데 3석을, 충북의 8석 가운데 5석, 충남의 10석 가운데 7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더민주 전신)은 대전에서 3석, 세종에서 1석, 충남에서 3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로 따져도 새누리당 37.9%, 선진당 15.1%를 더하면 민주통합당 33.3%를 앞섰다.
19대 총선 직후 치러진 18대 대선 역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4.5%를 득표한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5.1%를 얻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여야가 충청권에서 '장군·멍군'을 주고받았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더민주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4곳을 석권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선 새누리당이 16곳(대전 1곳, 충북 6곳, 충남 9곳), 더민주가 13곳(대전 5곳, 충북 3곳, 충남 5곳)을 가져갔다.
이처럼 충청당이 새누리당에 흡수통합된 이후 충청권 표심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이번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더민주에 비해 우세를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여야가 내세우는 인물 대결과 충청권 현안 해결에 어느 정당이 적임이냐가 여야의 충청권 승패를 가를 주요변수로 거론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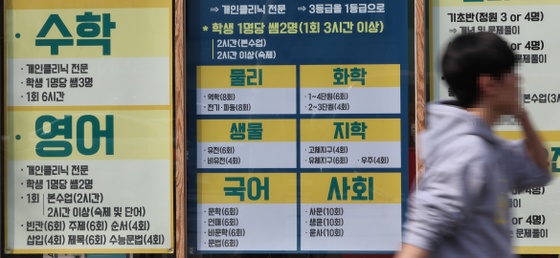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