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이름 팝니다"…미국 MLB, '네이밍 라이트'만으로 연30억 이상 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슈 리포트
경기장 명칭안에 자사브랜드…기업은 그 대가로 재정 지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국내 야구장 4~5곳도 도입

네이밍 라이트 사용은 기업이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기장 이름에 자사의 브랜드를 붙이는 스포츠 후원 활동의 하나다. 1973년 미국 미식축구팀 버펄로 빌스의 홈 경기장 명칭이 ‘리치 스타디움’으로 바뀐 게 첫 번째 사례다. 일본은 1997년 후쿠오카 돔구장 명칭을 야후가 사들여 ‘후쿠오카 야후돔’(소프트뱅크)으로 불리면서 처음 네이밍 라이트를 도입했다. 200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형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네이밍 라이트 도입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06년. 넥센타이어가 부산 사직야구장에 대한 명칭사용권을 얻기 위해 5년간 연간 3억원, 총 15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네이밍 라이트 컨설팅’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구장 명칭 사용에 따른 적정 후원액으로 연간 5억원을 주장해 상호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국내 모든 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짓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로 분류·관리한다. 대부분의 지방 공무원은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부분 경기장은 지명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지자체가 전국체육대회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등을 개최하면서 짓게 된 산물이라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면 경기장 이름을 판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사실이다.
상황이 바뀐 건 국내 프로야구 열기 덕분이다. 국내 네이밍 라이트를 적용한 첫 사례로 기록된 경기장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는 기아자동차가 옛 광주 무등야구장 옆에 신설한 경기장이다. 기아차는 여기에 300억원을 투자해 ‘광주’라는 지명과 함께 ‘기아’라는 기업명을 쓸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를 운영해 얻는 수익은 미미해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돈 먹는 하마’가 됐다. 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 현재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해 한화생명 이글스파크(2015년), 수원 KT위즈파크(2015년), 인천 SK행복드림구장(2015년) 등에 경기장 명칭사용권이 도입돼 새롭게 불리고 있다. 내년 2월 대구에 개장하는 새로운 야구장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결정돼 계약서 날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송현 부산대 교수는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 사용자(구단), 지역 주민, 홈 팬, 기업(스폰서) 등 다양한 참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칭사용권을 도입해야 상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프로팀이 운영하는 경기장 이외에 각종 체육관과 체육공원 등 다양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명칭사용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뉴욕증시, S&P500 또다시 사상 최고...테슬라 5%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B202406180635366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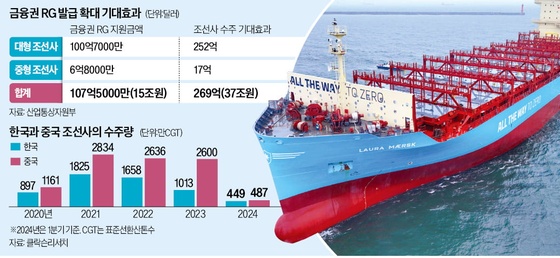





![EDM 한 우물 판 '월디페', 오히려 좋아…9만명 환호했다 [리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6402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