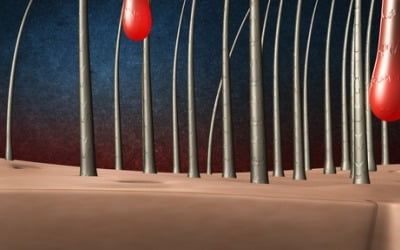일본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 '우리' 중시하며 쉽게 흥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극 리뷰 - '신모험왕'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신모험왕’(사진)은 일본 극작·연출가 히라타 오리자의 대표작 ‘모험왕’을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을 배경으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오리자와 성기웅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대표가 함께 창작했다.
이스탄불의 저렴한 숙소를 무대로 젊은 배낭여행자들이 현실에서 도피해 여행을 한다는 설정은 ‘모험왕’과 다르지 않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양국 젊은이들은 같은 아시아인이자 비슷한 처지의 여행자로서 쉽게 어울리는 듯하면서도 뭔가 서로 어긋난다. 경기에서 이탈리아에 밀리던 한국이 동점골을 넣자 일본인들은 불편한 느낌을 드러낸다.
일본인 눈에 비친 한국인은 이렇다. ‘우리’를 중요시하며 쉽게 흥분하고, 그만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다. 일본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한다. “한국 사람은 꼭 ‘우리’를 붙여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와이프…. 여러분은 한국인에게 무언가를 ‘공유당한’ 경험 없어요?”
한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일본인은 ‘역사적 배경’을 지우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이들의 대화에는 식민지배, 러·일전쟁 등 터키와 일본, 한국인 사이에 굴곡진 역사가 얽힌다. 광주에서 온 인후는 일본인들과 한방을 쓰고 싶어 하지만, 정작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순한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침략을 저지른 거지?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다는 듯이 행동하잖아.”
하지만 두 나라 젊은이들은 불통과 어긋남의 관계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고베 대지진,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상처를 공유한다. 소영과 보미, 슬기처럼 세상을 떠도는 젊은이들의 삶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모험왕’ 속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과 겹쳐진다.
양국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를 통해 소통하며 생기는 어긋남이 이 작품의 묘미다. “‘아시아’를 같이 봐요, 이스탄불에서!”라고 외치는 장면은 “두 나라의 연극인이 서로의 샅바를 단단히 움켜잡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던 오리자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오는 26일까지, 3만원.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