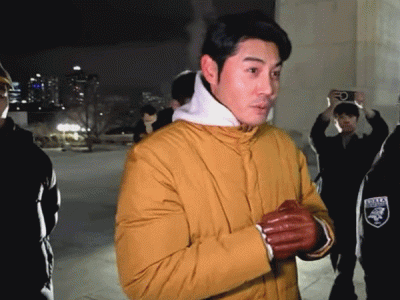호주와도 연구개발 MOU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극에서 거침없이 기지 수를 늘려가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남극에 매설된 풍부한 지하자원을 노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남극연구에서 1988년 세종기지를 세운 한국보다 먼저 첫발을 뗐지만 미국 러시아 등 남극 연구를 주도해온 국가에 비하면 시작이 늦었다. 미국은 1955년 맥머도 기지를 지었고 러시아는 1957년 보스토크 기지를 지었다. 시작은 늦었지만 중국은 30년이 채 안 돼 미국의 기지 수(3개)를 뛰어넘었다. 남극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극조약에 서명한 52개국 중 중국이 가장 공격적으로 남극기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남극에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쇄빙선(얼음을 깨 항로를 개척하는 배)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2만t 규모의 쇄빙선 쉐룽호를 이미 갖고 있다. 한국 쇄빙선인 아라온호(7500t급)에 비해 대규모다. 중국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자체적으로 약 2만t 규모의 쇄빙선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건조에 들어갔다.
중국은 또 지난해 11월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호주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남극 탐험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남극에서 약 3200㎞ 떨어진 호주 호바트시에서 쉐룽호를 출발시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쉐룽호에 시승해 “중국은 호주 및 국제사회와 함께 남극 지역을 더 많이 연구하고, 남극의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겠다”며 중국이 극지연구와 자원개발에 공들이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극 자원 노리는 것 아니냐”
남극에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다. 인류가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와 희귀광물인 희토류가 묻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천연가스, 석탄 등도 풍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남극 연구에 열을 올리는 것이 미래 자원 개발을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극엔 식량자원도 풍부하다. 남극해에는 크릴새우가 대량 잡힌다. 다양한 어족 가운데 크릴새우가 주목받는 것은 몸체가 크고(길이 6㎝, 무게 1g)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남극의 크릴새우 양은 5억t 내외로 추산된다. 세계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1억t이 채 안 된다.
그러나 남극조약에 따라 2048년까지 이런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 남극조약은 1959년 워싱턴DC에서 타결된 것으로 남극에서의 군사활동을 막고 남극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48년 이후의 상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중국은 아직까지 자연과학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남극의 얼음을 채취해 150만년 전부터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연구 중이다. 남극 얼음 속에 있는 공기방울은 눈이 쌓일 때의 공기이므로 당시 기후를 분석하는 귀중한 자료다.
‘극지방의 강국, 중국’이라는 책을 쓴 매리 브래디 뉴질랜드 캔터베리대 교수는 “중국이 남극의 광물과 원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밀라드 코핀 호주 남극해양연구소장도 “남극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얼음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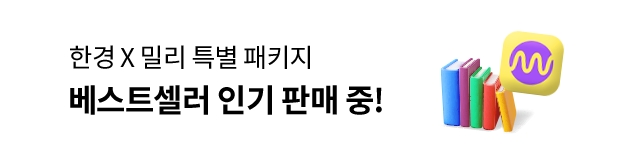
![[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49022.3.jpg)

![한은 총재 "이전 탄핵정국 때도 성장경로 수정 없었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4113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