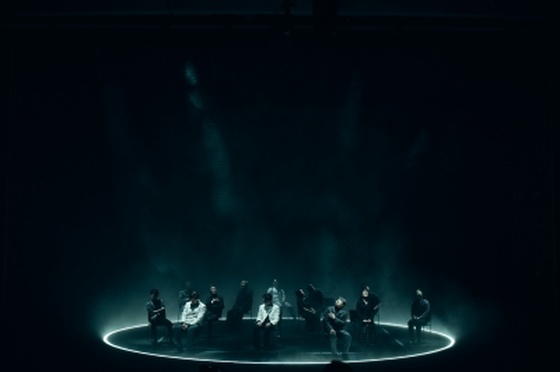하나·외환은행 통합 중단 가처분…'2·17 합의' 도대체 뭐길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합의서는 2012년 2월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맺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외환은행 노조의 거센 반발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승인을 1년 이상 미룬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때부터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 협상에 들어갔다. 외환은행을 꼭 인수하고 싶었던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마라톤 협상 끝에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김기철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결과물이 ‘2·17 합의서’다.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으로선 ‘5년 독립경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 합의문이 됐다.
금융위도 이 과정에서 중재에 나서며 ‘당사자’가 됐다. 지난 4일 법원은 “당시 금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내용에 대한 진정성까지 표현한 합의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합의는 노조의 ‘만능열쇠’가 됐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잔여 지분 40% 인수, 해외 법인 통합 등에서 노조는 사사건건 2·17 합의를 내세웠다. 2·17 합의서는 다른 인수합병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했을 당시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5년 독립경영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