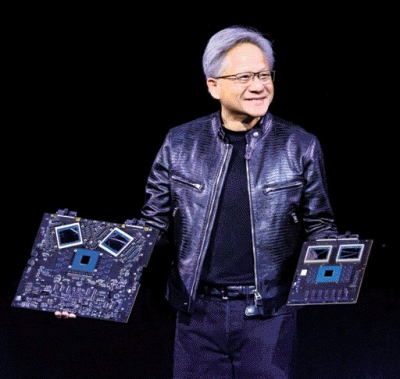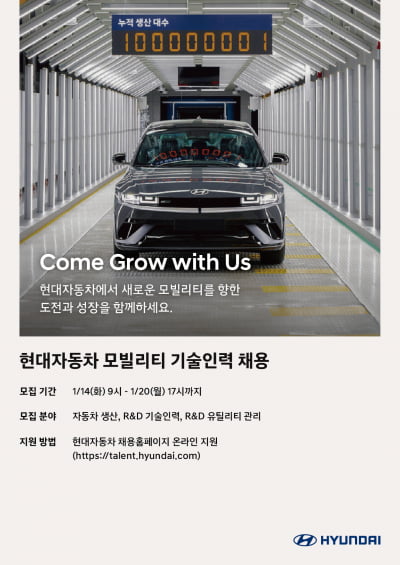창사이래 두 번째 실적 올려
일부에선 '저가수주' 의혹도
대박의 비결은
LNG선박 기술확보 주효
영업·기술팀 통합도 효과

지난해는 조선업계에 ‘악몽의 해’였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오일 메이저의 실적 부진으로 해양 플랜트는 물론 선박 발주가 급감했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49억달러어치를 수주, 조선 3사 중 유일하게 수주 목표액(145억달러)을 달성했다. 창사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연간 수주액이다. 실적 쇼크에 시달린 경쟁사와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9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조선업계 일각에서 ‘대우조선 저가 수주 의혹’이 퍼진 이유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IHS마리타임 등 해양 전문 매체는 “대우조선해양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다. 연료 효율을 20% 이상 높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과 얼음을 뚫고 지나가는 쇄빙LNG선 등 세상에 없던 기술을 선보이며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LNG선 ‘발상의 전환’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LNG선에 집중했다. 당시 유가 상승세로 경쟁사들은 해양플랜트 개발과 수주에 열을 올릴 때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적인 셰일 에너지 개발 붐, 환경 규제 강화로 천연가스 운송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분야에 자본을 집중 투입했다.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엔진, 연료 공급장치,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재기화 장치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년간 연료 공급장치 관련 특허 200건, 재기화 장치 관련 특허 38건을 국내외에 출원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첫선을 보인 천연가스 부분 재액화 장치 ‘PRS’는 세계 선박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LNG 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돼 버려진다. 천연가스 손실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보랭재라 불리는 연료 탱크 자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경쟁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발상에서 벗어나 손실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택했다. 화물창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냉매로 재활용하면서 선박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것. 대우조선해양의 기술 혁신을 주도한 권오익 상무(기본설계1팀장)는 “선박은 인도 후 25~30년 사용하는데 운항비에서 60~70%를 차지하는 건 연료비”라며 “자동차 연비를 낮추듯 연료를 가장 적게 먹는 배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었다”고 말했다.
◆조직 칸막이 없애고 영업력↑
조선업은 대형 수주 산업이다. 선주들의 요구에 맞게 견적을 내고 2~3년에 걸쳐 설계와 건조를 한다. 선박 가격이 2억~3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선주들은 신기술 도입에 매우 보수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체 개발한 비장의 기술로 선주들을 설득하는 ‘도박’을 감행했다. 지난해 3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적인 가스 관련 신기술 행사 ‘가스텍’에서다. 세계 선주들을 상대로 천연가스가 액화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보수적이던 선사들이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까지 LNG선 수주량은 3척에 불과했지만 7월 이후 34척을 추가 수주했다. 이 중에는 세계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47억4000만달러(약 4조7969억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수주전도 포함됐다.
박형근 대우조선해양 상무(선박영업팀장)는 “남들보다 먼저 쇄빙선 관련 기술을 준비한 게 주효했다”며 “LNG선 기술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세계 발주사들이 대기번호표를 뽑고 우리 영업팀을 기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한 고재호 사장의 경영 수완도 주효했다. 고 사장은 부사장 시절 업계 관행을 깨고 영업팀과 기술팀을 한 조직으로 묶는 실험을 했다. 영업팀은 기술을 알아야 하고, 기술팀은 영업 실무를 알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상무는 “선박 수주전은 분초를 다투는 전쟁터와 같다”며 “한번 신뢰를 잃으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기술팀과 영업팀이 뭉쳐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게 선박 재발주율을 높인 비결이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