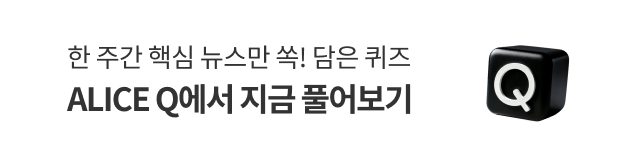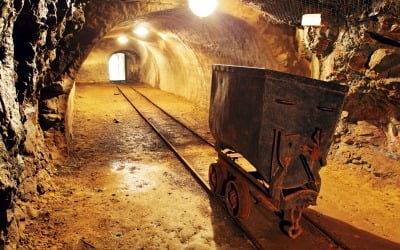영화 '인터스텔라' 속 과학지식 3가지

영화 ‘인터스텔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력(重力)이란 개념에 의문을 계속 던진다. 영화 속 중력은 단순히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는 힘만이 아니다.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고, 공간을 휘게 만든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16년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리는 세계다.
개봉 12일 만에 관객 500만명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SF영화 인터스텔라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제작된 영화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제작에 깊이 관여한 킵 손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는 칼 세이건이 1985년 ‘콘택트’를 집필할 때도 조언해준 이론물리학자다. 인터스텔라로 일반인도 관심이 커진 웜홀과 블랙홀 등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지식을 정리한다.
(1)밀러 행성에서 23년 허비한 이유

밀러 행성은 초거대 블랙홀인 ‘가르강튀아’ 주변을 가깝게 도는 행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구보다 6만배 이상 천천히 흐른다. ‘중력에 따른 시간 지연’ 현상은 지구에서도 나타난다.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항법장치(GPS) 위성은 지표면보다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지구의 수신기와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계산으로 이를 보정해야 한다.
(2)베일에 싸인 블랙홀 내부
인터스텔라는 블랙홀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로 유명하다. 가르강튀아는 질량이 태양의 1억배에 달하며, 크기는 태양에서 지구 거리만큼 크다. 블랙홀이란 이름은 빛과 온도를 내보내지 않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따왔지만 영화 속에선 밝게 빛난다.
가르강튀아가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먼지와 가스는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면서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하고, 마찰열을 내면서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른다. ‘강착 원반’이라 불리는 가르강튀아의 빛나는 고리가 바로 그것이다.
가르강튀아의 위와 아래에 생긴 빛의 고리는 ‘중력 렌즈’ 현상을 보여준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질이 공간을 휘게 만들며, 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중력이라고 봤다. 가르강튀아 뒤에서 오는 별들의 빛은 휘어진 공간을 따라 구부러져 관찰자의 눈앞에 도달하면서 가르강튀아를 감싸는 고리를 형성한다.
인듀어런스호나 밀러 행성이 블랙홀에 빨려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건의 지평선’ 밖에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 탈출 여부를 가르는 경계로, 한 번 이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 블랙홀 중력의 원천인 ‘특이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도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3)웜홀 통한 우주여행 가능할까?
인듀어런스호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토성 근처에 만들어 준 ‘웜홀’을 통해 100억광년 떨어진 먼 은하로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빛의 속도로 100억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을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어 SF 영화에서 단골로 나오는 소재다. 영화에선 구부린 종이를 연필로 뚫어 웜홀을 설명했다.
웜홀 역시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실제 존재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하지만 영화처럼 실제 우주 여행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우선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양자역학 수준의 아주 작은 입자들만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매우 불안정해 구멍이 언제 사라질 지 모르며, 어떤 곳으로 통할지도 알 수 없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