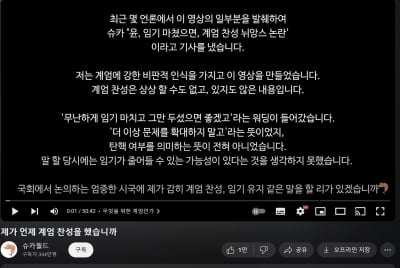자동차에서 공기가 필요한 곳은 엔진이다. 동력을 얻으려면 연료와 공기가 섞여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폭발력을 얻지 못해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자동차에는 공기 중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가 마련돼 있다. 보다 깨끗한 공기를 활용해야 연료를 잘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는 극복해야 할 적(敵)이기도 하다. 주행 때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921년 독일 과학자 에드문트 룸플러는 왜건형 자동차인 ‘트로펜(tropfen)’에 공기저항 개념을 도입했다. 덕분에 트로펜 자동차는 공기저항 계수(Cd) 0.28로 한참 뒤인 2000년에 만들어진 BMW M3의 0.33보다 낮았다.
일반적으로 공기저항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Cd’는 항력계수(Coefficient of Drag)를 의미한다. 넓은 사각형 판자가 공기와 부딪칠 때 받는 마찰을 측정해 사용하는데, 초창기 자동차의 항력계수는 평균 0.7 정도였다고 한다. 통상 항력계수가 0.5를 넘으면 저항이 큰 것으로 여기지만 요즘 대부분 자동차는 0.4 안팎을 기록한다.
스포츠카로 불리는 차들은 0.3 이하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같은 성능과 무게일 때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서다. 과학적으로 항력계수를 10% 줄이면 연료 효율은 5%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 공기저항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기가 차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이다. 1738년 베르누이는 공기 흐름의 속도가 증가하면 물체를 누르는 힘(기압)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기가 차체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모양을 다듬는 게 공기역학 디자인이다.
자동차회사가 앞다퉈 자랑하는 항력계수는 자동차 앞 면적과 비례한다. 면적이 작으면 항력계수도 낮고, 넓으면 계수도 커진다. 앞 면적은 레이저빔으로 해당 자동차의 너비를 측정한 뒤 같은 방식으로 얻어낸 높이의 80%만 곱해서 산출한다. 최근 자동차 앞 면적이 자꾸 좁아지는 배경이다. 물론 공기저항 관계없이 웅장함을 연출하기 위해 앞 면적을 넓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율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넓음의 자비’는 통하지 않는다.
공기저항을 가장 덜 받는 이상적인 모양은 물고기를 떠올리면 된다. 항력계수가 0.03~0.04 정도에 불과하다. 형태만 있을 뿐 거의 저항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현실에서 비슷한 자동차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나마 2005년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였던 바이오닉 콘셉트카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당시 발표된 항력계수는 0.19로 매우 낮았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GM이 최초의 양산 전기차로 내놓은 EV1의 0.195를 0.005가량 단축시킨 기록으로 화제를 모았다.
자동차 동력원이 휘발유가 아닌 무공해 첨단 연료로 바뀌어도 공기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력을 얻는다. 그래서 일부에선 아예 공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탱크에 저장할 공기를 압축하기 위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자연적으로 압축되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공기는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할 ‘지킬과 하이드’인 셈이다.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