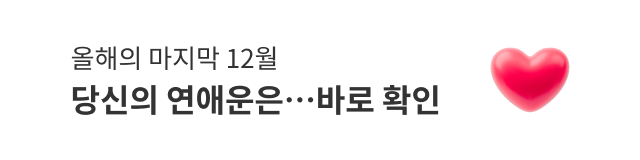○신청 기업은 4분의 1로 급감

이유가 뭘까. 정부는 지난해 이 제도를 부활하면서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로펌·회계·세무법인 등은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했다. 2000년대 중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으로 옮기면서 억원대 연봉을 받는 데다 이로 인한 민·관 유착이나 부패 등의 부작용이 불거진 탓이다. 안행부 심사임용과 관계자는 “기업들이 민·관 유착 논란 등을 의식해 신청을 꺼린다”며 “그나마 신청하는 기업도 대부분 협회뿐 순수 민간기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신청한 공무원 지원자도 지난해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민간근무휴직제도에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려 선발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제도를 부활하면서 대상 공무원 연봉은 휴직 직전 보수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신청 직급도 기존엔 3급(부이사관)이 포함됐지만 일반직 4~7급에만 국한시켰다. 안행부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 탓에 각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공고를 내도 신청자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중소기업 왜 가나”…공무원들 시큰둥
새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A부처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협회나 중소기업인데 누가 가서 배우려 하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B부처의 한 간부는 “부처에서 잘나가는 공무원들이 뭐하러 중소기업 민간직을 가겠느냐”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갔다 오면 손해라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민간근무휴직자에 대한 색안경 낀 시선도 공무원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다.
결국 정부의 제도 보완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많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사회의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부작용만을 의식할 게 아니라 젊은 공무원 중심으로 민·관 교류를 더욱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재직 시절 1년가량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파견근무를 다녀온 뒤 “기업이 최고 애국자”라며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안행부 인사정책관은 “정부도 이대로 가다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보완해야 할 점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 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고, 민·관 인사 교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대상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의 4~7급 공무원.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