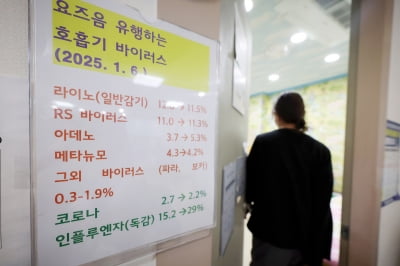최근 47세의 늦깎이로 첫 시집 《단 한 명뿐인 세상의 모든 그녀》(북인)를 발표한 이철경 시인의 얘기다. 어둡고 배고팠던 고아원 시절 그에게 빛이 됐던 건 문학이었다. 고아원에 있던 조그만 도서관에서 김소월 강은교 등의 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시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공고 졸업 뒤 공단에 취직하고 나서 습작을 시작했다. 그는 “그때 그 시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폭력 속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인의 길을 걷기엔 삶의 압력이 너무 컸다. 결혼 후 얼마되지 않아 아내가 사라지면서 졸지에 두 딸을 키우는 ‘싱글대디’가 됐다. 돈이 필요했고, 임금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산업대 야간대학에 진학했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공릉동까지 매일 왕복하며 졸업장을 땄다.
“과거 이야기는 지인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시집을 냈다는 건 어차피 다 드러내는 거니까…. 시를 쓸 때도 처음엔 제 상처를 외면했는데, 그러니까 안 써지더라고요. 가장 큰 걸 두고 곁가지만 끼적거렸으니 될 리가 없었죠.”
본격적으로 문학을 시작한 건 2007년 고려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부터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였다. 2011년 목포문학상 평론 부문에 당선되며 평론가로 먼저 등단했고 지난해 초 시 전문 계간지 ‘발견’을 통해 시인으로 데뷔했다.
자신의 과거를 토해낸 이번 시집에는 ‘허기’와 ‘결핍’의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그의 시는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희망과 빛으로 도약한다.
‘대책 없이 허기진 아이들의/ 얼굴에는/ 마루 밑바닥에/ 생옹이 박히듯/ 응어리 하나씩 담겨 있다// 옹이구멍으로/ 햇살이 스며들자/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물건들이/ 꿈틀거린다/ (…)/ 햇살은 버려진 아이들의/ 눈망울에 걸려 있는/ 어둠을 닦아내며/ 뻥 뚫린 옹이의 흔적을 지워내고 있다.’ (‘마룻바닥 밑에서’ 부분)
그는 토요일마다 전북 정읍에 내려가 한부모,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친다.
“아이들과 상처를 나누면서 많이 배웁니다. 사람은 왜 꿈을 꿔야하는지를 느끼죠. 토요일 새벽기차를 타야 해서 ‘불금’에 술 한 잔 못하지만요(웃음). 아이들에게는 ‘빵’과 ‘옷’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문학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꽃에 물을 주듯이 말이죠.”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순모 실타래 같은 ‘모계의 꿈’ [고두현의 아침 시편]](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2667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