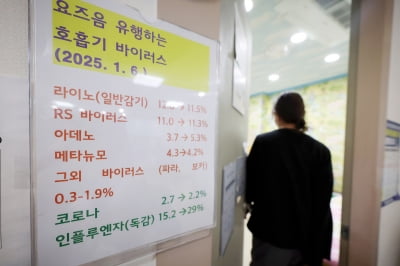‘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보석을 갈아 눈과 입에 발랐다/립스틱의 기원이 되었다/고대인들은 빛나는 눈과 입술로/별에 닿고 싶어 했다,/라고 나는 단정한다/(…)/당신은 욕망을 천천히 날아올라/별이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당신은 아침마다/당신의 입술에 날개를 그려 넣는 것이다/입술을 칠하며 별을 건너는 것이다//당신,/반짝인다’(‘립스틱 발달사’ 부분)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도 남자는 ‘먼 별’에 있거나 ‘서역’에 있다. ‘남자가 소매를 걷어 손을 내밀었’지만 ‘내민 손을 여자가 가슴에 묻었다’(‘별똥별’). 그래서 여자는 다시 혼자다.
‘유폐(幽閉)란 보고 싶다는 말보다 조금 안쪽의 말 꽃잎은 꽃잎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당신은 서역의 사람/(…)/나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지웠다 삶은 단 한 줄이 모자란 늦은 편지’(‘목백일홍 별사(別辭)’ 부분)
이처럼 시집은 시종일관 아프고 쓸쓸하다. 닿지 않는 등을 생각하며 ‘삶은 종종 그런 것이다, 지척에 두고서도 닿지 못한다’고 말하며 시인은 ‘당신’을 그린다.
‘얼굴을 감싸면 낮에도 젖은 별이 뜬다/당신이라는 계절이 잠시 다녀갔다//반어법처럼 고요하다/손바닥이 젖은 이번 생(生)은’(‘당신이라는 시간’ 부분)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네버랜드'의 갈등 안타까워](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22251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