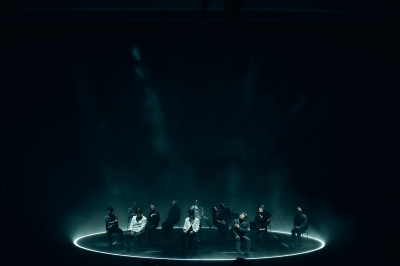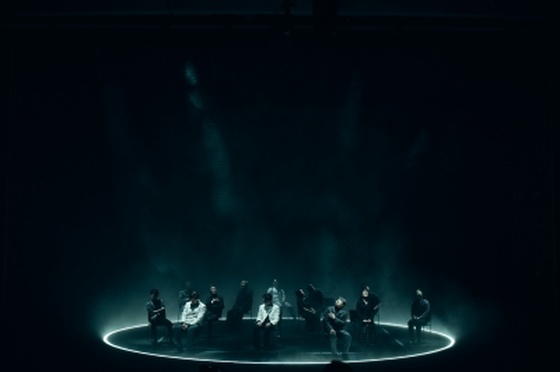고은 시인 "바람은 평생 부여잡을 내 문학의 젖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담집 '두 세기의 달빛' 나란히 출간
문단의 원로인 고은 시인(80)의 일기다. 고 시인이 1973년 4월부터 1977년 4월까지 자신의 일기를 담은 《바람의 사상》과 출생 이후 1950년대 초까지의 삶을 시인이자 소설가인 김형수 씨와 대담집으로 엮은 《두 세기의 달빛》을 한길사에서 내놓았다. 《바람의 사상》에서는 1970년대 유신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으로서의 고뇌를, 《두 세기의 달빛》에서는 문학과 철학, 역사를 아우르며 세상과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 시인은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인간의 생애는 인류사의 긴 과정을 요약하고, 지금의 독자들은 내가 살아온 시대의 풍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며 책을 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 그는 시가 아닌 일기나 대담을 책으로 낸다는 걸 ‘시 쓰기에 대한 훼방’으로 느낀다. 그는 “이 책은 내 문학에서는 별 게 아니다. 나는 시를 쓰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출간을 결심한 건 “문학과 역사를 동의어라 생각하며 살아온 시기의 기록이 거대담론뿐 아니라 미시사로서의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금의 독자들에게 당시의 문학적 진심과 고뇌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것도 이유였다. 그는 1970년대 이후의 일기와 1950년대 이후 삶에 대한 대담도 이어서 내놓을 예정이다. 두 책의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바람은 내 문학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끝없이 흘러가고 고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평생을 통해 다가가고 부여잡고 싶은 그런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바람의 사상’이라 지었습니다. ‘두 세기의 달빛’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살아가는 이중의 존재라는 자각에서 나왔어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도 분명하기보다는 명암이 섞여 있는 깨달음에 가깝고….”
고 시인은 1970년대를 “우리의 소년소녀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지금처럼 숙련된 시각으로 파악해야만 시대나 상황이 들어오던 때가 아니라 비논리적인 눈으로 살던 때였다는 의미다. 대담집에서 주로 말하는 1930~1950년대가 자신의 ‘시간적 본적’이라면 1970년대는 ‘시간적 고향’이라고도 했다.
대선 결과를 평가해달라고 하자 “1월이나 2월까지는 덕담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심각한 사회분열에 대해서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회통합을 외치지만 이는 구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갈라진 간극을 메우기 위한 물이 없다면 마중물을 넣어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젊은이들의 내일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통합은 사전(事前)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반 이후에 실현되는 결과입니다.”
올해 만으로 80세를 맞은 그의 기억력은 정확했다. 몸과 말 모두 흔들림이 없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대에서 주는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음달 베네치아로 떠난다. 베네치아대의 요청으로 한 학기 동안 체류하며 시를 쓰고 6월에 돌아올 예정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냄새도 연기도 없다" 입소문…없어서 못 파는 '신종 담배'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6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