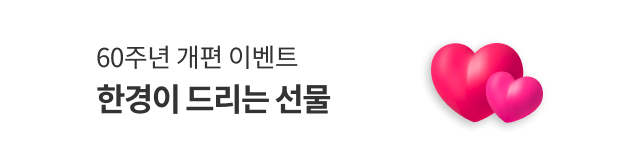리듬이 좋아야 똑바로 굴러가게 칠 수 있어
프로골퍼들에게 퍼팅은 우승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로 꼽힌다. 올 시즌 성적이 부진한 양용은(40·테일러메이드), 김경태(26·신한금융) 등은 시즌 내내 퍼팅 난조에 시달렸다. 양용은은 “퍼팅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많았다”고 한다. 김경태는 “외견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꼭 넣어야 할 퍼팅을 놓쳤다. 퀄리파잉스쿨 때도 퍼팅이 안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너나할것 없이 퍼팅 등 쇼트게임 연마에 공을 들인다. 아무리 드라이버샷 거리가 좋고 아이언샷이 정확하다고 해도 마무리 퍼팅이 안 되면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상문(26·캘러웨이)은 2009년 한국오픈 최종라운드와 올해 액센추어 매치플레이 8강전에서 만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차이점에 대해 “예전에는 멀리만 쳤지 쇼트게임이 별로였는데 올해는 퍼팅과 쇼트게임이 월등히 좋아져 빈틈이 없어 보였다”고 평했다.
아마추어 골퍼들 역시 퍼팅에 자신이 없다면 좋은 스코어를 내기 어렵다. 톱 프로골퍼들이 추천하는 퍼팅 비법을 소개한다.
◆박인비=난 퍼팅할 때 스피드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 그린라인이야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스피드가 맞아야 한다. 슬라이스나 훅라인은 스피드가 맞아야 들어간다. 아무리 라인을 잘 봐도 스피드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 이에 따라 대회장에 도착하면 그린 상태 적응에 주력한다. 남들은 연습 그린에서 똑바로 가는 연습을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은 안 한다. 오히려 롱퍼팅으로 거리감 맞추는 연습을 한다. 내리막 퍼팅은 홀에서 똑 떨어지게 하고 오르막 퍼팅은 1m 지나가게 한다. 어떤 그린에서든 이런 스피드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퍼팅은 ‘롤링(구름)’이 좋아야 한다. 보통 아마추어들의 볼은 공중으로 붕 튀었다가 굴러가거나 사이드 스핀이 걸려 이리저리 흔들리며 간다. 스핀이 걸리지 않고 똑바로 굴러가야 좋은 퍼팅이다. 퍼터 헤드의 힘이 볼에 가장 잘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리듬이 중요하다. 퍼터 헤드의 움직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김대섭(아리지)=퍼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는 볼의 롤링에 달려 있다. 롤링이 좋으려면 당구에서 ‘오시’처럼 볼의 윗부분을 밀어주는 식으로 쳐야 한다. 아마추어든 프로든 정확하게 퍼터 페이스의 가운데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볼 위를 쳐서 똑바로 굴러가게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난 퍼터의 토(앞쪽) 부분을 들고 친다. 그러면 볼 윗부분을 때릴 가능성이 많다. 헤드 페이스 정중앙에 안 맞아도 된다.
정확한 스트로크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퍼팅할 때 안으로 뺐다가 ‘∞’자처럼 스트로크한다. 바르게 스트로크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힘이 들었다. 차라리 편하게 치는 게 나은 것 같다. 스트로크에 크게 신경쓰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시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손목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는 무거운 퍼터를 사용하는 게 낫다.
◆김하늘(비씨카드)=내 퍼팅 스트로크는 짧게 딱 끊어치는 스타일이었다. 이런 스트로크는 그린 스피드가 빠르거나 상태가 좋은 그린에서 효과적이다. 출발만 잘 시켜놓으면 볼이 알아서 굴러간다. 그러나 그린 상태가 나쁘거나 느리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그린에서는 볼이 좀 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임팩트 구간을 길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미는 것이 낫다. 그린 상태에 따라 밀고 때려야 한다.
짧은 퍼팅이 남으면 속으로 ‘이 퍼팅은 골프치면서 수천 번 넣었던 것’이라고 되뇌인다. 자신감을 갖고 스트로크가 빨라지지 않게 리듬을 생각하면서 한다.
◆이미림(하나금융)=일관되게 치기 위해 리듬을 가장 중시한다. 연습하면서 ‘하나~둘’ 세면서 스트로크를 한다. 아마추어들이 퍼팅을 잘 하는 길은 연습뿐이다. 시간이 없다면 5분이라도 집중력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