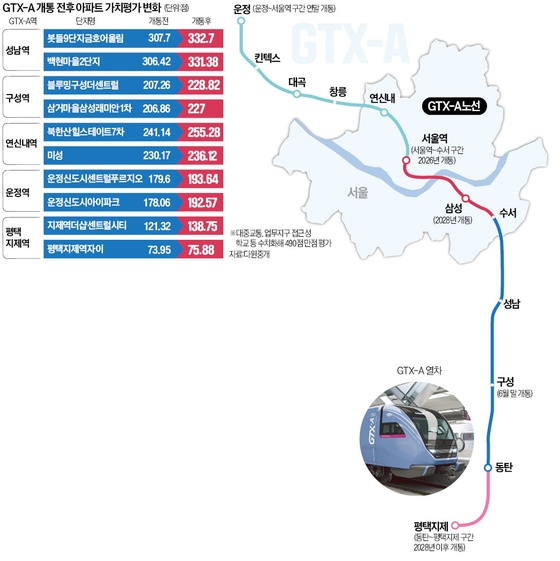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사설] 모자란 전력, 돈으로 때울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가 막히는 일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피크타임에 조업을 하지 않은 기업들에 정부가 주는 보조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예고 시점에 기업들이 전력을 절감하면 ㎾당 평균 524원씩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여름 폭염 기간에 3500억원을 썼고 연말까지 총 4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보조금은 국민의 호주머니 돈인 전력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물론 전력이 고갈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비상 상황을 막을 수밖에 없는 전력 당국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돈으로 풀면서 비상 사태를 피해가는 이런 기이한 전력 정책을 계속 끌고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애초부터 중장기 전력 공급을 잘못 세운 결과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DJ정부 때 만들어진 1차 전력공급 계획에서 10년 후 전력 수요 전망을 낮춰 잡았던 게 지금껏 영향을 주고 있다. 그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력 공급 계획을 내놓았지만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풀지 못한 채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 10년전에 세운 1차 공급 계획에선 2012년 목표 최대 수요가 6300만㎿로 지금 수요보다 무려 1000만㎿나 차이가 난다. 에너지의 수요 전망과 전력 공급 전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달 말에 세워야 할 6차 전력 기본 계획은 아직 뼈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 비중이 우선 결정돼야 석탄이나 가스 등 나머지 에너지원의 비중도 결정된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조차 꿀먹은 벙어리다. 더구나 민주통합당 후보는 원자력을 폐기해야 한다고 외쳐댄다.에너지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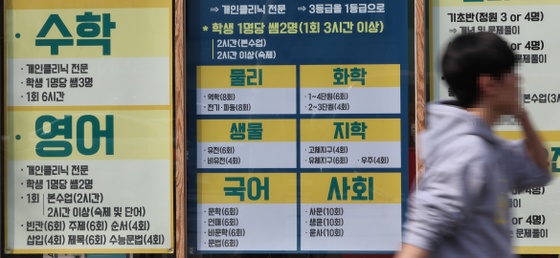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