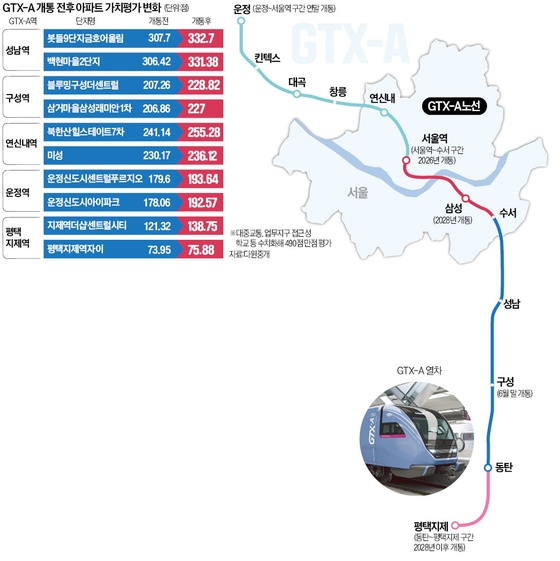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취재수첩] 워싱턴이 보는 한국판 '재정절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달 말까지 세제 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인들은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는다. 감세혜택 종료에 따라 가구당 평균 3500달러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자동 삭감된다. 실업자들은 수당이 깎이고, 기업들은 정부 발주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군수업체를 비롯해 몇몇 대기업은 해고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보잉 등 150여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1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동시에 편지를 보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타협을 호소했다. 이번이 두 번째 서한이다.
하지만 협상은 맴돌고 있다. ‘부자 증세’와 복지 지출이 걸림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0만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공화당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세금인상보다는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맞선다. 오바마는 “복지예산을 줄이면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치킨 게임’ 양상이다.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에 내몰린 데는 이유가 있다. 과도한 정부 빚 탓이다. 최근 4년 동안 연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국가부채가 총 16조달러를 넘어섰다.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주범이다.
한국의 재정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후가 걱정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각각 5년간 97조원과 192조원의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한결같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선물(복지)을 퍼주겠다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담을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판 재정절벽 협상’을 벌여야 할 때가 머지않은 것 같아 두렵다.
장진모 워싱턴 특파원 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속보] 액트지오 "석유 매장 가능성 발견…시추로 입증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6122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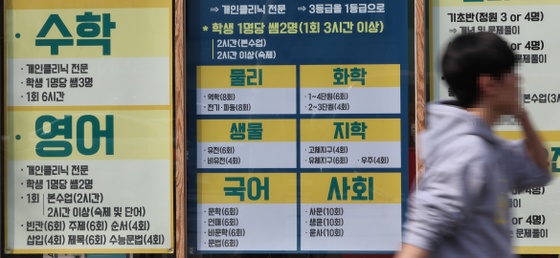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