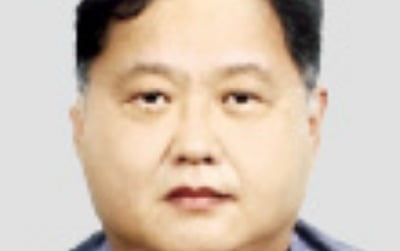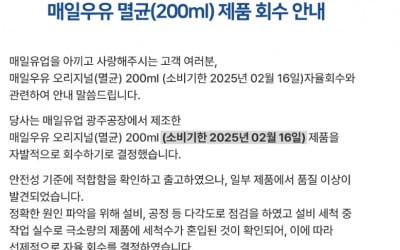[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유럽위기 신조어'로 본 외국인 복귀시점은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엔나 이니셔티브·G유로…시간 걸리지만 '해결' 가능성
러시아 최고의 경제학자인 그리고리 야블린스키는 유럽위기의 원인으로 ‘레알에코노믹(Realeconomik)’을 꼽는다. 종전에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도 미비와 감독 소홀, 인간의 ‘탐욕’에서 찾았다. 하지만 유럽위기는 도덕성의 상실로 인해 부정과 부패, 탈법 등이 만연한 유럽사회의 뿌리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점이 다르다. 이 용어는 그런 의미다.
유럽위기가 제때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그 성격도 크게 변했다. 초기에는 그리스 재정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이제는 금융위기로 악화됐다. 이 국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다. 단일 국가와 달리 유럽은 ‘통합’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염되는 ‘뱅크 런 도미노(Bank Run Domino)’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뱅크 런 도미노’를 막기 위해 한편으로 방어벽을 쌓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완충자본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과거 동유럽 위기 때 서유럽 금융사들이 포괄적인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해 해결했던 ‘비엔나 이니셔티브(Vienna Initiative)’를 재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기를 막는다고 해도 그리스 처리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로존 잔존을 고집해왔던 독일이 그리스 탈퇴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스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유럽위기의 최후 보루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리스 처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유로존에서 완전히 탈퇴시키는 ‘그렉시트(Grexit· Greek+Exit)’와 ‘G 유로(Greece+Euro)’ 방안이다. ‘G 유로’는 외형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 잔존시키면서 독자적인 경제운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의 경제수렴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위기를 풀어갈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은 구제금융 부담을 덜 수 있는 ‘윈윈 방식’으로 ‘그렉시트’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리스 처리방안으로 ‘G 유로’가 선택된다면 포르투갈 등과 같은 경제여건이 나쁜 회원국들(bad apples)도 이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 ‘G 유로’에 이어 ‘P 유로(Portugal+Euro)’가 탄생한다면 유럽통합 앞날에는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유로화의 ‘이원적인 운영체계(two way band system)’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체계는 유로화가 도입되기 이전에 운영됐던 ‘유럽조정메커니즘(ERM·European Realignment Mechanism)’과 원리는 동일하다. 즉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경제여건이 좋은 회원국들(good apples)은 경제수렴조건을 보다 엄격(narrow band)하게 관리하고, 나쁜 회원국들은 느슨(broad band)하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유럽통합의 기본 골격도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통화통합과 재정통합이 동시에 달성돼야 한다. 주무부서로 유럽중앙은행(ECB)과 가칭 ‘유럽재정안정기구(EFSM·European Fiscal Stabilization Mechanism)’, 상징물로 유로화와 유로본드 간의 ‘2원적 매트릭스(Two by Two Matrix)’ 체제를 갖춰야 한다.
유럽위기는 통화통합은 달성해 놓고 재정통합은 추후 과제로 남겨 놓았던 것이 원인이 됐다. 세금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과 재정지출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할 때, 초기부터 재정통합을 달성해 놓지 못한다면 여건이 안 좋은 국가부터 재정위기가 발생한다. 이때는 통화통합을 달성해 놓은 것이 화근이 돼 재정위기는 다른 회원국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당분간 재정통합의 상징인 유로본드 발행에 독일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과반수의 회원국들이 찬성하고 있어 조만간 대타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간의 ‘메르콜랑드(Merkollande·Merkel+Hollande)’ 체제가 작동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슈퍼 선데이’ 이후 독일은 긴축을, 프랑스는 성장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기 관련 신조어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유럽통합은 ‘붕괴’보다 ‘해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때가 되면 요즘 대거 이탈하는 유럽계 자금이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위기해법 도출에 정치적 명분을 중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절벽 효과(cliff effect)’에도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