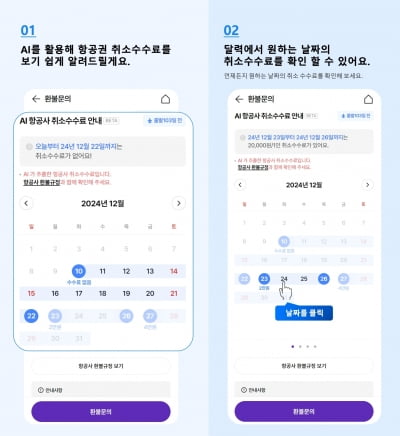천국과 가장 가까운…시간도 쉬어가는 '신비의 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태평양의 파라다이스 뉴칼레도니아
에코투어의 낙원
4500년 된 소나무 등 즐비…숲길 하이킹·카약도 즐겨
산호빛 '천연 풀장'
바위섬 둘러싸여 파도 잔잔…형형색색 열대어의 놀이터
에코투어의 낙원
4500년 된 소나무 등 즐비…숲길 하이킹·카약도 즐겨
산호빛 '천연 풀장'
바위섬 둘러싸여 파도 잔잔…형형색색 열대어의 놀이터

인천을 출발한 지 9시간가량 지나자 비행기가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누메아에 닿는다. 누메아는 바게트처럼 생긴 본섬 그랑드 테르의 남부에 자리한 프랑스풍 도시다. 길게 뻗은 해변을 한가로이 걷는 사람들, 항구에 늘어선 수많은 요트, 형형색색에다 아기자기한 모습의 크고 작은 집들이 프랑스의 니스를 연상케 한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원주민들은 ‘봉주르’라며 유창하게 프랑스어로 인사한다. 거리의 프랑스어 간판은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태고의 모습 그대로
발걸음을 옮겨 시내로 가본다. 야자나무에 둘러싸인 코코티에 광장. 누메아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는 쉼터로 프랑스에서 가져 온 조형물들이 눈에 많이 띈다. 한가로이 산책하는 사람들, 분수대 아래 기대 삼삼오오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다. 여유롭고 정겹다. 유럽인과 한데 어우러지게 된 원주민의 삶이 궁금해진다. ‘치바우 문화센터’로 향한다.
민족지도자 장 마리 치바우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이 문화센터는 3000년 역사를 지닌 카낙(Kanak)족의 멜라네시안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다. 놀이기구처럼 생긴 10개 동의 건축물은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가 소나무와 원주민의 전통가옥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것. 멀리서도 눈에 띄는 독특한 외관이 감탄을 자아낸다.
누메아 동쪽 야테지역에 있는 ‘블루리버파크’는 수백종의 나무와 희귀 동식물로 가득하다. 태고의 모습을 담고 있어 쥐라기 관련 다큐멘터리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하다. 뉴칼레도니아의 상징인 날지 못하는 새 ‘카구’와 세계에서 가장 큰 비둘기 ‘노투’, 밑동 굵기만 해도 어른 24명이 둘러싸야 할 만큼 굵은 수령 4500살의 카오리 소나무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다. 눈 호강으로도 모자라 숲길을 따라 하이킹을 즐기고 강가에서 수영과 카약으로 멋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으니 에코 투어리즘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산호색 바다와 침엽수림의 만남

가까이에서 본 일데팽의 모습은 지금껏 상상해온 열대지방의 모습과는 딴판이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나무는 야자수가 아니라 소나무다. 폭이 좁고 키가 40~50m를 훌쩍 넘는 아로카리아 소나무다. 산호색 바다와 침엽수림의 만남. 세상에서 오직 일데팽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솔향 머금은 일데팽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오로 천연 풀이다.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15분 정도 오로만을 따라 걷다 보면 동북쪽 해변에 자그만 바위섬이 둘러싸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천연 풀장을 만나게 된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늘 잔잔하다. 수심은 1~2m 정도로 얕다.
천연 풀장 안에서 자라는 산호 덩어리를 따라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보금자리를 튼다. 물 밖에서도 물고기떼가 훤히 보인다. 준비해온 빵조각을 던져본다.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거는 호기심 많은 물고기들이 몰려든다. 초대형 야외 풀장과 수족관이 만나 이루는 풍경이 현란하다. 일데팽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다.
◆탄성 절로 나오는 무인도의 아름다움
일데팽 쿠토해변을 떠나 보트를 타고 30여 분을 달리다보면 푸른 바다 한가운데 하얀 모래사장이 신기루처럼 펼쳐진다. 무인도인 노캉위 섬이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실눈조차 뜰 수 없다. 파도와 바람소리마저 증발해버린 듯 고요하다. 배 시간에 맞춰 체류 시간을 40분만 줄 정도로 섬은 작고 앙증맞다.
뉴칼레도니아에는 사람이 살지 않은 미니 섬들도 많다. 본섬 남쪽에 있는 아메데와 메트르가 대표적이다. 외딴 섬에 오롯이 선 등대가 전부여서 ‘등대섬’이라고 불리는 아메데. 모젤항에서 배로 40분 정도 걸린다. 스노클링 후에는 원주민의 전통공연과 함께 맛깔스러운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다. 경쾌한 리듬에 저절로 어깨춤이 나온다. 태평양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뉴칼레도니아는 프랑스령 국가다. 프랑스어가 공용어지만 영어와 일본어도 쓰인다.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한국보다 2시간 빠르다. 에어칼린항공(aircalin.co.kr)이 매주 월·토 인천공항에서 누메아로 직항편을 운항한다. 9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연평균 섭씨 영상 20~28도의 축복받은 봄 날씨. 남반구의 겨울인 4~11월에 여행하기 좋다. 화폐는 1퍼시픽프랑(CFP)이 13원 정도. 한국에서 유로로 환전해 현지에서 퍼시픽 프랑으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뉴칼레도니아 관광청 한국사무소(new-caledonia.co.kr).
사슴·코코넛게 요리…입도 즐거운 미식여행

누메아에는 바스크, 알자스, 노르망디 등 프랑스 각 지방의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많아 남태평양에서 프랑스의 맛 일주를 즐길 수 있다. 누메아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덤베아에선 프랑스 직송의 치즈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식 스낵바와 식당들도 많다.
누메아에서 벗어난 오지 마을에서는 사슴, 새우, 코코넛게, 멧돼지와 각종 과일로 만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부냐는 뉴칼레도니아의 멜라네시안들이 결혼식 등의 잔칫날에 먹는 전통요리. 생선이나 새우, 바닷가재를 얌, 고구마, 타로 같은 구근류 채소와 함께 코코넛 즙에 재운 다음 바나나 잎에 싸서 뜨겁게 달군 돌에 익혀 먹는다.
뉴칼레도니아=이정희 기자 ljh994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