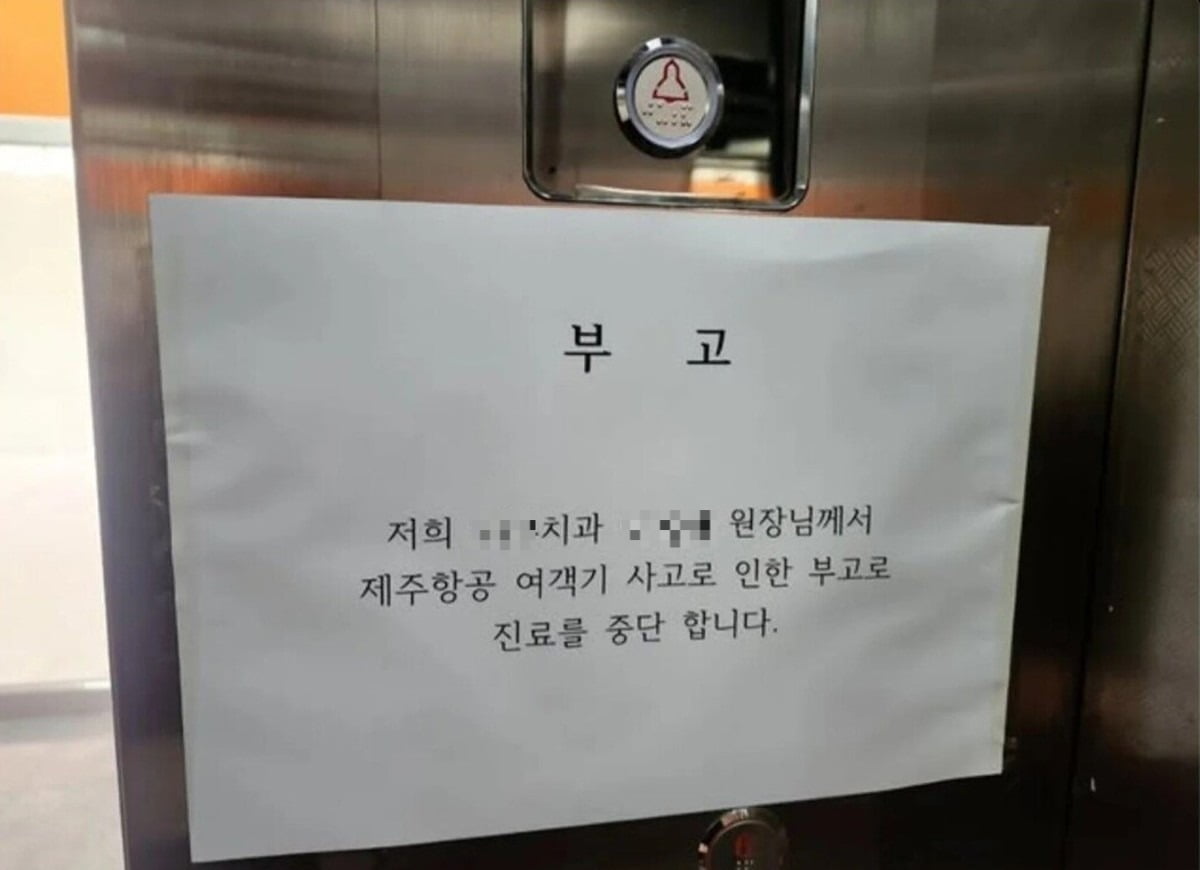지난달 26일 늦은 여름 휴가를 맞은 기자는 서울 시내 한 대학을 찾았다. 입학한 지 9년 만에 졸업하는 한 후배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본관 앞에는 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교정 한켠에선 익숙한 과거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었다. '핫셀블라드' '마미야' 등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어깨에 걸친 사진사들이었다. 샘플 사진을 붙여놓은 입간판을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찾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편리하고 값싼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필름 카메라는 설 자리를 잃었다.
비단 카메라뿐만은 아니다. LP판은 CD를 거쳐 MP3 파일로 바뀌었다. 종이책 역시 전자책으로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면 현재는 분명 디지털의 시대다. 1995년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디지털이다(Being Digital)'란 책에서 말한 '디지털 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을 압도하고 있다. 아날로그는 이렇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잊혀져가는 것일까. 그저 한때의 그리움이나 연민으로 남게될 감성에 불과한 것일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숫자를 다루는 방식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기술적 우열로 단정짓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실 이 둘의 차이는 숫자를 다루는 방식일 뿐이다. 아날로그의 어원은 닮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analogia'다. 아날로그는 수를 '간접적'으로 다룬다. 가령 눈금이 그려진 자로 선의 길이를 쟀더니 9.6㎝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자.정확히 말하면 선은 9.6㎝와 9.7㎝ 사이의 어느 한 점에 있을 것이다. 정확한 선의 길이는 아니다. 본질적으로 아날로그는 숫자를 '측정'한다.
반면 디지털은 'digit(숫자,손가락)'라는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수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물건을 세기 위한 손가락이 숫자 자체를 뜻하게 됐다. 1,2,3처럼 분명히 셀 수 있는 일종의 모자이크 구조다. 눈금과 같은 중간값은 없다.
아날로그에는 모든 숫자가 존재한다. 연속적이다. 하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값을 알아낼 수는 없다. 반면 디지털은 모든 숫자를 보여주지 않는다. 단절적이다. 그렇지만 측정하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답을 내어준다. 디지털은 계산이고 아날로그는 측정이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우열 관계는 아니다.
◆'Being Analog'
디지털 기기,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으로 전 세계는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어디든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ubique'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현실이 됐다.
디지털의 시대 한복판에서 다시 아날로그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단순하다. 10여년을 갓 넘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떠올려보고 필요한 것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다. 컴퓨터에서 흰색은 빛의 3원색인 빨강,초록,파랑 세 가지 색이 각각 255(16진수로 FF)라는 값을 가질 때 만들어진다. 이 방법으로 1670만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화가가 팔레트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물감을 조합하는 순간에는 1670만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잇값'이 만들어질 수 있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이상의 해상도를 보여주지만 필름 표면에 묻은 화학약품이 반응해 나타나는 '입자감'까지 따라잡을 수는 없다. CD와 MP3 파일은 언제 들어도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가끔은 LP판이 플레이어의 바늘과 닿으며 내는 마찰음이 그리울 때도 있다. 'Being Digital'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모든 삶을 디지털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본질적으로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디지털로 뒤덮인 현대 사회에서 가끔은 'Being Analog'도 생각해볼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승우 IT모바일부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