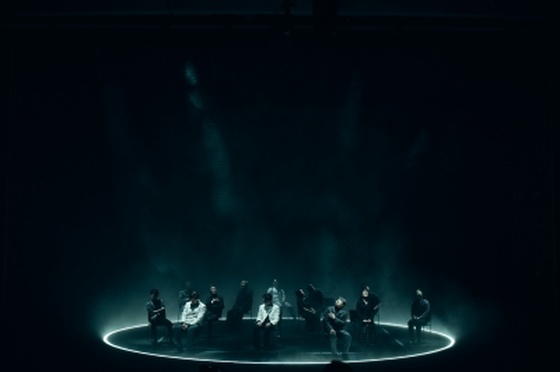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Strong KOREA] (2) 학과 벽 깨고 미래에 투자…과학강국엔 '그들만의 비결'이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학기술강국 비결
학문간 융합, 미래연구
美 MIT, 모든 학과 공동연구
獨, 태양광·풍력에 집중 투자
이스라엘, 자유토론 정착
산학협력·강소기업 토대 마련
中, 칭화대內 지주회사 설립
日, 소형 인공위성 제작에 13개 철공소·배선업체 참여
①학문 간 융합
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자연대와 공대 석 · 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이 연구소에선 석사 1학년 동안 자신의 전공이 아닌 수업을 들어야 한다. 물리학 전공자가 화학,생물학,전자공학,컴퓨터공학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식이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1년 뒤 전공 분야로 돌아왔을 때 생각의 폭이 몰라보게 넓어진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미국 MIT미디어랩에선 감정을 읽는 컴퓨터,혈당과 혈압을 측정하는 거울 등 온갖 희한한 연구가 이뤄진다. 연구실엔 공학도만 있는 게 아니다. 음악 의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여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지식경제부 연구 · 개발(R&D) 전략기획단의 김선영 융합신산업담당 MD(총괄책임자)는 "MIT(매사추세츠공대)나 칼텍(캘리포니아공대) 같은 대학은 필요에 따라 학과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②20~30년 뒤를 내다보는 연구
미국 국방부 산하의 'DARPA'.국방연구소지만 당장 눈앞의 무기 개발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보단 '미래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컴퓨터용 마우스,스텔스 같은 민 · 군 겸용 기술이 나왔다.
독일은 최근 국가 R&D의 총체적 목표를 녹색기술로 정했다. 언젠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남보다 한발 앞서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모은 것이다.
③확실한 산학 협력 모델
중국 칭화대는 2003년 칭화홀딩스란 지주회사를 만들었다. 교수나 학생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 성공하는 사례가 늘자 이런 기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회사(지주회사)를 만든 것이다. 현재 칭화홀딩스는 상장회사 3개를 포함해 총 28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대학의 실험실 벤처가 기업을 넘어 거대 그룹으로 발전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설립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명문 히브리대는 1964년부터'이숨'이란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있다. 대학이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를 팔아 이익을 내고,그 이익을 대학의 연구자금에 재투자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대학은 기부금으로 살아가지만,히브리대는 기술료 수입으로 살아간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전국 40개 도시에 60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분소는 지역의 대학,기업과 손발을 맞춘다. 지역밀착형 산학연 협력모델인 셈이다.
④강소기업의 힘
2009년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H2A로켓에는 '마이도 1호'라는 소형 위성이 실려 있었다. 오사카 지역 13개 중소기업이 제작한 기상관측위성이었다. 이공계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일본 기업의 저력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위성 제작에 참여한 기업은 대부분 직원 수 30명 안팎의 철공소나 배선업체였다.
⑤권위에 도전하는 문화
이스라엘에선 '후츠바'가 미덕이다. '뻔뻔함' 정도로 번역되는 이 말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나 마음껏 묻는 것을 뜻한다.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군대나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에도 후츠바는 통용된다. 권위에 짓눌리지 않고 의문을 품는 과정은 창조적 발상으로 이어진다.
노벨상 수상자만 6명 배출한 교토대의 마쓰모토 히로시 총장은 그 비결에 대해 "자유로운 학풍,권위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토론 문화"를 꼽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