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트로 홀인하면 1타 얻어
'라운드당 퍼트 수'는 폐지
그러나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퍼팅했느냐를 중요한 항목으로 삼은 새 측정 방법은 기존의 이론과 고정관념을 뒤흔든다.
◆컬럼비아대 경제학자가 개발
새 측정방법은 미 컬럼비아대 비즈니스 스쿨의 마크 브로디 교수가 개발했다. 이 방법은 PGA투어 전체 선수들의 평균 퍼트 수와 개인의 퍼트 수를 비교 측정하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 퍼트를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거리별 평균 퍼트 수를 대조해 누가 잘했는가를 판정한다.
투어 통계를 측정하는 '샷링크'는 지난해 성적을 토대로 1인치(2.56㎝)당 선수들의 평균 퍼트 수를 산출했다. 예컨대 홀까지 8피트(약 2.4m) 거리에서 평균 퍼트 수가 1.5타라고 할 때 한 번에 홀에 넣으면 0.5타가 가산된다. 두 번 만에 넣으면 0.5타가 깎이고,3퍼트를 하면 1.5타를 잃게 된다. 20피트(약 6m) 거리의 평균 퍼트 수는 1.9타다. 한 번에 넣으면 0.9타가 가산되고 실패하면 0.1타가 감점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한 골퍼가 10m 지점에서 1퍼트로 홀인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투어 평균은 2퍼트다. 그렇다면 그 골퍼는 1퍼트(1타)를 얻는다. 만약 2퍼트를 했다면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그러나 3퍼트는 1타를 잃는다. 이런 식으로 매 홀에서 얻은 '퍼팅 획득 타수'는 18홀 전체로 합쳐진다. 이 기록은 다양한 거리에서 1퍼트나 3퍼트를 확연하게 구분해 퍼팅 능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린 주변서 퍼트 수 줄이던 건 옛말
기존의 퍼팅 통계는 선수들의 퍼팅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총 퍼팅 수'가 적다고 무조건 스코어가 좋지는 않았다. 기준 타수 만에 '레귤러 온'을 하지 못하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샷을 하면 아무래도 볼이 홀에 잘 붙어 1퍼트로 홀아웃해 퍼트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된 통계가 그린에서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퍼팅하는가를 중시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또 '라운드당 퍼트 수'는 칩샷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면 퍼트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해왔다. 퍼팅 능력과 관련 없는 칩샷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온그린 상태에서 퍼트 수'도 결국 아이언샷 능력이 퍼팅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이언샷이 정확할수록 홀에 근접하게 되고 결국 퍼팅 수는 줄어든다.
거리를 감안하지 않은 퍼팅 능력 측정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총 퍼트 수가 26개로 빼어나다 해도 여러 개의 칩인을 성공시켜 그랬을 수 있고,32개로 많은 퍼팅을 했지만 그린에서 좋은 플레이를 했을 수도 있다.
◆최경주는 110위 머물러
새 기준으로 퍼팅 능력을 측정한 결과 세계랭킹 317위에 불과한 존 메릭(미국)이 1.046타로 1위에 올랐고 그레그 찰머스(1.033타)가 2위를 차지했다. 퍼팅을 잘하기로 소문난 짐 퓨릭(사진)은 0.320타로 49위다.
이번 산정으로 '상위 랭커 50위' 가운데 퍼팅 능력에서 100위권 밖으로 처지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최경주도 투어 평균보다 0.042타를 잃어 110위에 머물렀다. 장타자로 소문난 더스틴 존슨(미국)은 0.218타를 까먹어 148위였다. 장타자가 퍼팅을 못한다는 속설은 크게 틀리지 않는 듯하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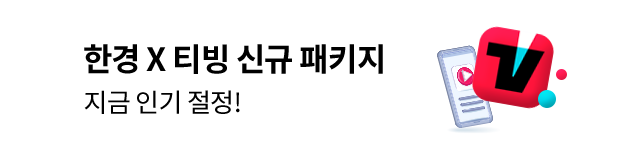


![[골프브리핑] 70%의 선택…타이틀리스트, 2024년 전세계 사용률 1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9642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