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허점 노린 편법 성행
돈드는 구조에 모럴 해저드도
◆다양한 편법이 문제
현행 정치자금법을 악용하는 편법이 문제로 지적된다. 차명계좌나 친 · 인척 등에게 몰래 건네는 '검은 돈'이 아닌 합법적인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특정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개인들이 수십명 또는 수백명 단위로 후원금을 낼 경우 이를 사전에 알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이번 청목회 건도 그렇고 특정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 이름으로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쪼개서 조직적으로 뿌리는 편법은 사실 관행처럼 돼 왔다"며 "아주 노골적으로 기업이나 단체와 연관된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이 사전에 시민감시단체나 선관위에게 적발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쯤이야"하는 모럴 해저드 만연
국회의원들의 '모럴 해저드'와 면책특권도 한 요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의 후원금은 물밑에서 받고 있다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한 전직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후원금 외에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 다수가 이런 저런 돈을 받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설마 걸릴까'하는 약간의 모럴 해저드가 만연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돈 드는 구조적 한계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돈이 드는 문제는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많다. 일단 당선되려면 선거를 치러야 하고 지역 사무소를 열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웬만한 중진의원은 지역구 관리에만 한 달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쓴다. 초선 의원으로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의원도 한 달에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보통 초선의원은 한달에 1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 세비를 몽땅 부어도 부족하다"며 "게다가 후원금을 연간 1억원 이상 모을 수 있는 의원도 299명 중 50명밖에 안돼검은 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만도 1인당 몇억원에서 몇십억원이 드는데 만약 대의원이 20만명쯤 되면 아예 돈선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돈 쓸 엄두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김호중·강형욱 왜 김건희 나오자 터지나"…음모론 '술렁'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36787753.3.jpg)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 걸"…허은아 화환에 담긴 의미는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N.36761428.3.jp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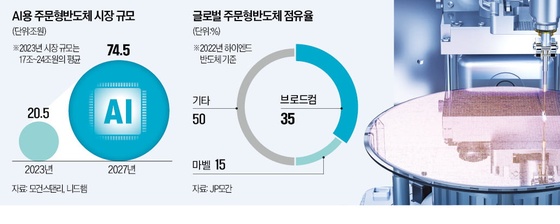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