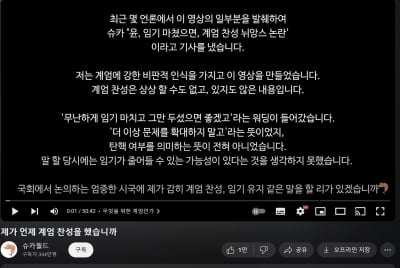"中企피해 과장" vs "중요사실 안 알려…사기계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수산重 '키코 2라운드'
대리인들 4시간 법정 공방
대리인들 4시간 법정 공방
중소기업과 은행 간 금융 파생상품 분쟁인 키코(KIKO)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키코소송의 대표격인 수산중공업과 우리 · 씨티은행 간 항소심 첫 심리를 가졌다. 재판이 열린 306호 법정은 4시간에 걸친 양측 대리인들의 열띤 법리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는 보기 드물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서는 등 항소심도 총력전으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산중공업 측은 은행들이 자료를 조작해 피해 기업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마치 키코가 아무런 비용(손실) 없이 환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것.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전문가인 은행 측이 상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도의 금융상품에 정보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투자할 경우 판매자는 비전문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의무까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은행들이 키코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키코 계약에 의한 피해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를 보유한 기업은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보유한 외화의 일부인 계약 금액과 비교해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은행 측 대리인은 "계약 때문에 없던 손해가 생긴 게 아니고 기업들이 환차익을 누리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측은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여세를 몰아 키코가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행들은 키코 계약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얻은 것은 1%도 채 안 되는 수수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일부 기업은 수출로 받은 외화액이 급감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지만 금융위기 사태는 은행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키코소송의 대표격인 수산중공업과 우리 · 씨티은행 간 항소심 첫 심리를 가졌다. 재판이 열린 306호 법정은 4시간에 걸친 양측 대리인들의 열띤 법리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는 보기 드물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재판부 설득에 나서는 등 항소심도 총력전으로 치달을 것임을 예고했다.
수산중공업 측은 은행들이 자료를 조작해 피해 기업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마치 키코가 아무런 비용(손실) 없이 환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는 것.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전문가인 은행 측이 상세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도의 금융상품에 정보가 부족한 비전문가가 투자할 경우 판매자는 비전문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의무까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은행들이 키코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 측은 "키코 계약에 의한 피해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를 보유한 기업은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보유한 외화의 일부인 계약 금액과 비교해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것.은행 측 대리인은 "계약 때문에 없던 손해가 생긴 게 아니고 기업들이 환차익을 누리지 못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측은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여세를 몰아 키코가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행들은 키코 계약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얻은 것은 1%도 채 안 되는 수수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측은 "일부 기업은 수출로 받은 외화액이 급감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지만 금융위기 사태는 은행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