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잊지못할 그 순간] "11년전 酒稅협상 '역발상'으로 소주 시장 지켰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
美·EU "양주 차별" 세금인상 압박
소주 한 병 1만5천원으로 뛸 위기
위스키 세율과 같게해 협상 타결
美·EU "양주 차별" 세금인상 압박
소주 한 병 1만5천원으로 뛸 위기
위스키 세율과 같게해 협상 타결
얼마 전,편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한 후배 녀석이 소주병을 내밀었다. "행님,쐬주 한잔 드소."
"내 아니었음 느들 이래 쐬주 못 묵는다. 아나?"
'국민주'인 소주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랜 친구처럼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왔다. 1970년대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내게 든든한 힘이 됐던 것도 돼지갈비에 곁들인 소주요,1999년 외환위기 직후 허한 마음뿐이었던 국민들을 위로해 주던 술도 소주였다. 이런 소주를 빼앗길 뻔한 사건,소주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내 인생 절대 잊지 못할 그 순간을 안주삼아 요즘도 친구들과 '가슴 벅찬' 소주잔을 기울인다.
후배의 소주잔을 받으며 한때 처절했던 '무용담'이 떠올랐다. 1997년 시작해 1999년 절정을 이뤘던 미국 · 유럽연합(EU)과의 '주세협상' 과정이 그것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이었던 나는 주세협상의 실무대표였다.
'주세협상'은 미국과 EU가 1997년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내 주세는 술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값싼 소주에는 35%,상대적으로 비싼 위스키에는 100%의 세율을 매겼다. 이에 미국과 EU는 같은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다른 것에 대해 차별 과세라고 반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인 종량세(알코올 도수에 따라 과세)가 공평하다고 주장했지만 속내는 소주 값은 올리고 수입 양주 값은 낮춰 국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매기면 소주 값이 10배 이상 뛰게 된다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술값과 관계없이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알코올이 25% 들어간 소주는 다른 술들과 비교할 때 한 병에 1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소주와 비슷한 일본 '쇼주'와 멕시코 '데킬라'도 이미 미국과 EU 앞에 무릎을 꿇은 터였다. 게다가 당시 한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소주를 '한국의 위스키'라고 선전한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WTO는 1998년 7월 첫 판결에서도,이듬해 1월 상소심에서도 소주나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 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나를 포함한 5명의 협상단에 비상이 걸렸다. 정덕구 당시 재경부 차관은 출국 전 "소기의 목적을 얻지 못하면 들어올 생각을 말라"고 지시했고 우리 역시 협상에서 진다면 귀국하지 않겠다고 각오했다.
1999년 3월 협상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이었다. 우리는 불과 48시간 동안 한국에서 브뤼셀로,런던으로,뉴욕으로,워싱턴으로 이동하며 짐도 도착하기 전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만큼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담당관이었던 메리 라티머의 '독사 같은 협박(?)'에 식은땀이 날 지경이었다.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무역보복을 가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는 마침내 기발한 '역발상'으로 해법을 찾아냈다. 종가세를 유지하되 '소주 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WTO의 판정 어디에도 세율이 동일하면 됐지 종량제를 도입하거나 세율 수준을 어떻게 하라는 언급은 없었다는 데 착안했다. 사실 그들이 원한 것은 위스키 세율을 낮춰 한국 시장을 잠식하겠다는 것이었다. 허를 찔린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해 연말 한국을 방문한 라티머도 우리를 찾아와 "그때 협상은 정말 멋진 싸움이었다"고 인정해줄 정도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큰 소주와 양주의 세율은 똑같이 72%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같은 세율이라 하더라도 소주 가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외환위기를 갓 극복한 절박했던 시기에 애국과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5명의 협상단은 소주잔을 눈물로 가득 채우며 고된 협상의 종지부를 찍었다.
당시 굴복했다면 '국민의 술 소주',"가볍게 쏘주 한잔 어때?"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며,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소주를 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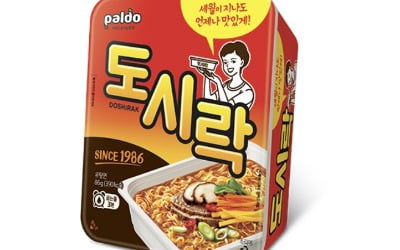
![뉴욕증시, 빅테크 우려에 퍼렇게 질렸다…제주에 비바람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ZA.3840633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