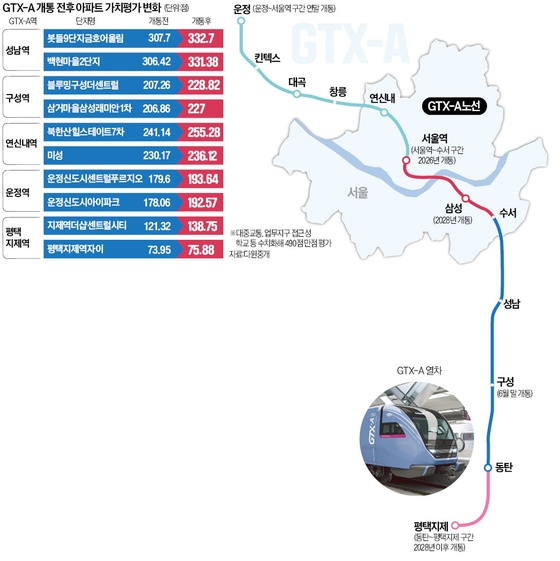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취재여록] 만년 '乙' 제약업계 뿔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 제약사 CEO(최고경영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이 같은 말로 일련의 정부 약가정책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바이오분야에 투자한 돈은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스며들었고,쓸데없이 낭비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는 '판데믹(pandemic)'상황을 맞아 세계보건기구(WHO)가 감탄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한 것도 우리 사회가 애써 평가절하하는 바이오투자가 근간이 됐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官)을 비롯해 병원,약국 등 눈치를 봐야 하는 갑(甲)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불리한 보건 및 의료정책이 나와도 눈치를 보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곤 했다. 이런 제약업계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단히 '뿔'이 났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반(反) 시장형 제도','저가구매 특혜 제도'로 몰아붙이는 성명서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는 등 응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정해진 약값의 범위에서 병원이 싼값에 구입하면 그 차액(최고가 대비)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때문에 제약업계는 음성적으로 병원에 전달됐던 리베이트가 국민보험료를 재원으로 양성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상 '갑'인 대형병원에 또 하나의 '칼자루'를 쥐어주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주고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가 됐다. 매번 약값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이런 논란 탓이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제약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양측이 날선 공방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제도 시행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쌍벌죄의 선도입과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제도' 등 대안에 대한 쌍방향 토론을 통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보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태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mrhan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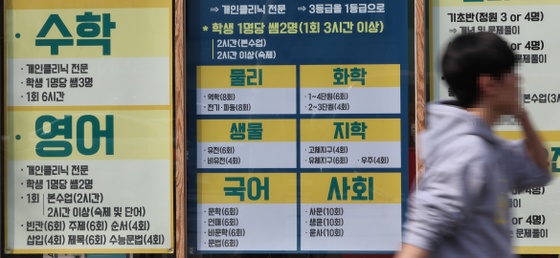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