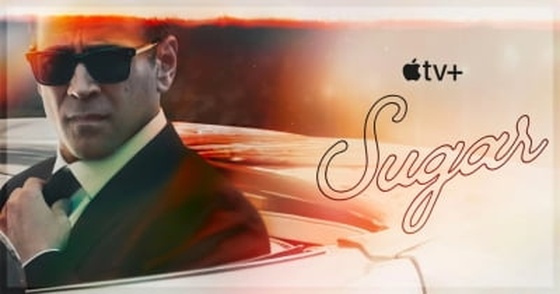[취재여록] 누굴 위한 공천 배심원제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민들은 충분히 후보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 문제될 게 없다. "(민주당 핵심당직자)
오는 6 · 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배심원제를 두고 뒷말이 많다.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자 한나라당은 공천후보심사위원회가 뽑은 후보의 탈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공천배심원제를,자유선진당은 충청지역에서 주민이 공천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공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공천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써부터 운영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성 문제다. 일례로 배심원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300명 안팎인 시민배심원단 가운데 절반인 150명은 중앙당에서 뽑고,150명은 지역에서 뽑아 구성하는 방식이다. 객관성을 위해 중앙당이 1000명의 풀을 구성해서 그 가운데 무작위로 차출해 배심원제를 택한 지역에 150명씩 내려보내겠다는 것이다. 지역 배심원은 유권자 가운데 선발된다. 한 관계자는 "생업에 바쁜 지역 유권자들을 배심원단으로 꾸리는 것도 문제지만 연령대별 지역별로 특정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령 배심원단이 꾸려진다고 해도 단 한 차례 토론회만을 지켜본 후 후보를 뽑는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인사는 "서울 김 서방이 한나절 광주 이 서방을 본 후 시장이 될 만한지 판단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정후보 밀어주기 차원이라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고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배심원제는 장점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스마트폰에 빗대 6 · 2지방선거의 참신한 '어플'(애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배심원제가 '미인대회'나 지도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버스떼기' '박스떼기'의 오명을 뒤집어썼던 국민경선제도와 다를 바 없다. 언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문제였다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김형호 정치부 기자 chs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美소비자 심리 둔화에 반락한 유가…"수요 강세 전망은 호재" [오늘의 유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603937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