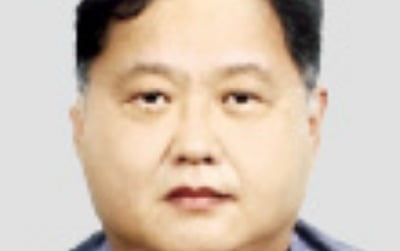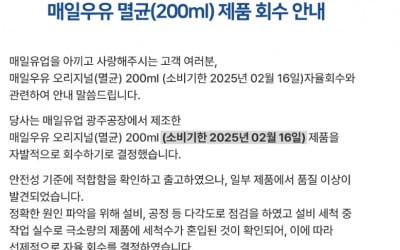[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위기 이후의 S커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현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1980년대 맥킨지의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범선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이르기까지 기술에 대한 수많은 관찰을 토대로 일관된 패턴 하나를 발견한다. S커브 성장곡선이 그것이다. 신기술 초기에는 기술의 성과가 부진하고 발전속도도 더디지만 다양한 시험기를 거치고 나서는 기술의 성과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곡선을 타게 되고, 그 뒤 기술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성과곡선이 완만해지면서 S커브를 그린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다. 포스터는 한 기업이 기존의 S커브에서 새로운 S커브로 갈아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두 커브 사이에 단절이 길면 기업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기업이 과거의 성과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기술로부터 최대한 이윤을 확보하려 들고,그러다보면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기 쉬워 다른 기업에 당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혁신기업의 딜레마'도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신,구 S커브 사이의 단절을 최대한 줄이면서 갈아타기를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느냐가 기업성장의 관건인 셈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다. 크게 보면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S커브로의 환승을 요구하는 파괴적인 기술은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도 동시에 몰고 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0년도 R&D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R&D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기초 · 원천연구투자를 늘린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R&D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R&D투자를 줄였던 일부 대기업들은 학습효과 탓인지 이번 금융위기에는 R&D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대기업들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R&D투자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 그대로 두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고갈될 판이다.
남은 문제는 늘어난 정부R&D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이르면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녹색을 말하지만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단지 녹색이란 이름을 덧씌운 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 의미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 · 원천연구 확대도 그렇다. 창의적 기초연구, 위험도가 높은 원천연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그저 적당히 통계만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 역시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늘려도 기존의 S커브만 연장시킬 뿐 새로운 S커브는 나오기 어렵다.
금융위기 이후 기술도, 산업도 그 전과는 다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몇 년 후 선진국들은 새로운 S커브로 바꿔타고 있는데 우리만 기존의 S커브에서 머물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투자배분을 정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과학기술단체들이 당당히 나서서 이슈를 제기하고 감시도 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하지만,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차제에 과학기술 행정이나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로 바꿀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다. 포스터는 한 기업이 기존의 S커브에서 새로운 S커브로 갈아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두 커브 사이에 단절이 길면 기업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기업이 과거의 성과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기술로부터 최대한 이윤을 확보하려 들고,그러다보면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기 쉬워 다른 기업에 당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혁신기업의 딜레마'도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신,구 S커브 사이의 단절을 최대한 줄이면서 갈아타기를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느냐가 기업성장의 관건인 셈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 목적은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다. 크게 보면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S커브로의 환승을 요구하는 파괴적인 기술은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도 동시에 몰고 오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0년도 R&D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R&D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기초 · 원천연구투자를 늘린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R&D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것은 위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R&D투자를 줄였던 일부 대기업들은 학습효과 탓인지 이번 금융위기에는 R&D투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나머지 대기업들과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R&D투자 축소가 불가피해보인다. 그대로 두면 성장잠재력 자체가 고갈될 판이다.
남은 문제는 늘어난 정부R&D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이르면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녹색을 말하지만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단지 녹색이란 이름을 덧씌운 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면 의미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 · 원천연구 확대도 그렇다. 창의적 기초연구, 위험도가 높은 원천연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그저 적당히 통계만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 역시 무의미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를 늘려도 기존의 S커브만 연장시킬 뿐 새로운 S커브는 나오기 어렵다.
금융위기 이후 기술도, 산업도 그 전과는 다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몇 년 후 선진국들은 새로운 S커브로 바꿔타고 있는데 우리만 기존의 S커브에서 머물고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투자배분을 정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과학기술단체들이 당당히 나서서 이슈를 제기하고 감시도 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으로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하지만,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차제에 과학기술 행정이나 정책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로 바꿀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