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악플ㆍ루머에 한없이 작아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현아 "신경 안쓴다고 하지만 상처는 받아"
며칠 전 한밤중에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한 A급 여배우는 컴퓨터를 켜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인터뷰 기사 중 한 문장 때문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말꼬리를 잡고 비난을 하고 있다. 너무 속상하다. 어쩌면 좋으냐. 'XXX'라는 욕설은 예사로 한다"며 속상해했다.
故 최진실의 목숨을 앗아간 주요 원인으로 악플과 루머가 지목되고 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악플이 달렸다.
발 없는 말이 지구를 몇바퀴씩 도는 세상에서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들을 보호할 장치는 없다.
2005년 일명 '연예계 X파일'이 노출돼 한바탕 큰 난리가 났지만 그 이후 'Y파일', 'X파일 2탄' 등 이를 모방하는 출처불명의 '루머 덩어리'가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 결국 연예인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내성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만난 송혜교가 "솔직히 이제는 악플을 봐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한창 활발히 활동 중이고 중화권에서 잇따라 CF를 찍는 한류 스타인 그는 네티즌들의 관심의 대상. 그러나 그는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이나 말들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솔직히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가끔 재미있기도 하다"며 편안하게 미소지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쓰면 어떻게 살겠어요.연예인이 된 순간부터 제 자신은 뭐 하나 시원하게 화를 내거나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남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가수 도전 과정에서 엄청난 악플에 시달려야했던 개그우먼 김미려도 "사실은 악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며 "눈앞에서 누가 날 비난하면 당황하겠지만 인터넷에서의 악플은 신경 안 쓴다.단련됐다"고 말했다.
가수 김장훈의 경우는 아예 인터넷 댓글을 보지 않는 경우. 그는 "댓글 안 본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부진 연예인들도 있지만 많은 연예인들은 자신을 향한 악플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쳐보고 관련 글을 다 읽고 나서야 잠이 드는 연예인이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촬영장에도 노트북을 가져와 틈틈이 확인하는 연예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진실과 MBC TV '나쁜 여자 착한 여자'에서 호흡을 맞춘 성현아는 "악플, 루머에 신경쓰지 말자고 다잡으면서도 어느새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잊어버리자고 하지만 상처는 받게된다"고 말했다.
"모든 연예인이 악플 때문에 괴로움을 느낄 거에요.그나마 심신이 건강할 때는 그것을 견디지만 마음에 병이 들면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인터넷에서 댓글을 없앴으면 좋겠어요.그러면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최진실의 오랜 친구인 이승연은 "나만큼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도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왔다.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봐도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면서 "무엇보다 어렵게 재기한 진실이가 악플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실의 상가를 찾은 많은 동료 연예인들은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입을 꾹 다물 뿐이었다.
최진실의 재기를 이끌었던 KBS 2TV '장미빛 인생'의 문영남 작가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할말이 없다.아니, 말이 안 나온다.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막힌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그가 생전에 짊어졌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우울증을 앓아왔던 고인에게는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대중의 애정보다 눈에 보이는 악플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최진실도 생전 MBC '시사매거진 2580'과 가진 인터뷰에서 "댓글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안 좋은 댓글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연기할 때 굉장히 소심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무섭더라"고 고백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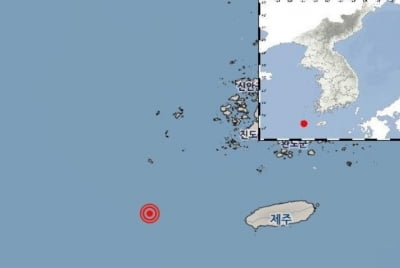




![[뉴욕증시-주간전망] 연준, 물가 보고서와 애플](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751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