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인사개혁 '헛바퀴'…1년 지났는데도 툭하면 공석ㆍ편법운영 여전
그런데도 45일째 공석이다.
지난 7월27일 김성진 전임 국제업무정책관이 조달청장으로 발령난 후 공모 절차를 밟느라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민간 지원자가 없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2.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 직위다.
그러나 한번도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온 적이 없다.
공모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항상 기획처 출신 몫이다.
정부의 공무원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의 통합 관리와 경쟁을 통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사를 배치한다는 취지로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이 제도는 도입 1년여 만에 각 부처의 골칫거리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재경부 산업자원부 등 10개 주요 정부 부처를 조사한 결과 개방형·공모 직위 128개 가운데 외부 출신은 모두 54명.그나마도 24명은 파견·전출에서 복귀했거나 인사교류식 맞교환으로 임용된 사람들이다.
순수 외부 임용은 3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민간 출신만 따지면 그 숫자는 16명으로 줄어든다.
물론 주요 보직에 영입된 민간인 출신은 거의 없다.
공모와 심사 등 절차가 복잡해 정부 고위직이 한두 달간 비어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후임자를 뽑으려면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재경부 국제업무 정책관의 경우처럼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외에도 이날 현재 기획처 사회통합정책관,법무부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외교통상부 안보연구부장과 통상전문관 등의 자리가 상당기간 비어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 통상전문관 자리는 작년 11월부터 10개월째 공석이다.
각 부처는 청와대 등 다른 부처로 파견 또는 전출갔다가 돌아온 해당 부처 출신들도 외부 임용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쓴다.
또 인사 때마다 외부 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고위직을 맞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위 공무원단이 아니라 '고위 네고(협상)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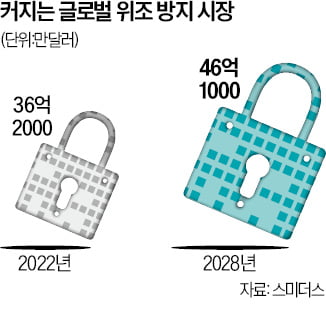
![[단독] 국힘, '당심 80%·민심 20%' 포함 4개안 투표 부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2048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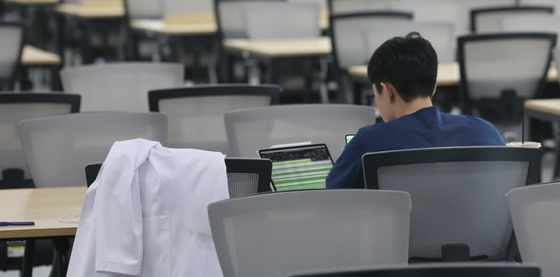

![[단독] 홈플러스,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한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692273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