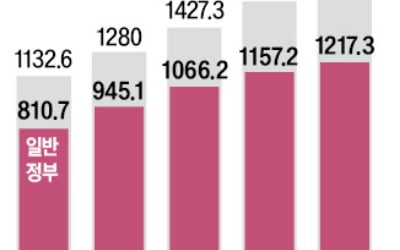[詩가 있는 갤러리] '어느 초밤 화성시 궁평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릿한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이맘때가 정말 마음에 든다.
황혼도 저묾도 어스름도 아닌
발밑까지 캄캄,그게 오기 직전,
바다 전부가 거대한 삼키는 호흡이 되고
비릿한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원지로 가는 허연 시멘트 길이
검은 밀물에 창자처럼 여기저기 끊기고 있었다.
기다릴 게 따로 없으니
마음 놓고 무슨 칠을 해도 좋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살아 있는 이 냄새,
밤새 하나가 가까이서 끼룩댔다.
혼자 있어서 홀가분한 이 외로움,
외로움 아닌 것은 하나씩 마음 밖으로 내보낸다.
(…)
쓰라리고 아픈 것은 쓰라리고 아픈 것이다.
비릿한 냄새가 기다리고 있었다.
더 비울 게 없으면 시간이 휘는지
방금 읽고 덮은 휴대폰 전광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
선창에서 배 하나가 소리없이
집어등을 환히 켰다.
-황동규 '어느 초밤 화성시 궁평항' 부분
마음을 비우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평범한 항구의 초밤도 그렇다.
비릿한 바다냄새와 허연 시멘트길,끼룩이는 밤새,선창에서 집어등을 켜는 배 한 척,그리고 외로움….무엇 하나 특별하지는 않지만 왠지 편안하고 좋다.
더 원하는 것도 없고,더 비울 것도 없는 까닭이다.
시인의 말대로 '쓰라리고 아픈 것은 쓰라리고 아픈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마음의 칼날을 세우지 말 일이다.
있는 대로 맞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진다.
이정환 문화부장 jhlee@hankyung.com

![[포토] 캐리비안베이서 북유럽 감성 노천탕 즐겨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2392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