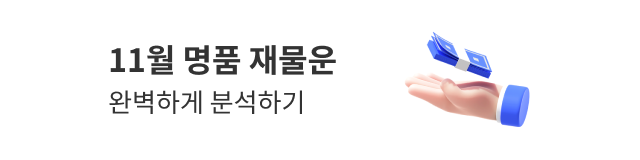하지만 예외인 곳이 있다.
금융산업.이미 생명보험 업계에선 외국계의 약진이 눈부시다.
처음에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겼지만 이젠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토종 생보사들의 생존까지 위협할 정도다.
외국 생보사의 힘은 무엇일까.
상·하 2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삼성생명의 중국 합작법인 중항삼성(中航三星).지난해 7월부터 중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스타일은 기존 중국 업체들과는 판이하다.
가장 큰 특징은 종신보험 위주라는 것.전체 매출 중 70%를 종신보험이 차지한다.
저축성 보험은 30%에 불과하다.
설계사들도 차이가 난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경력 3년 이상인 '엘리트' 여성들 위주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을 기대하는 전략이다.
중항삼성의 전략은 모기업인 삼성생명을 닮지 않았다.
오히려 삼성생명과 경쟁하는 외국계 생보사들에 더 가깝다.
미국계 푸르덴셜생명.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 회사는 4년제 정규대졸 출신의 직장 경력 2년 이상인 사람들을 설계사로 선발했다.
그리고 종신보험만 고집해왔다.
처음에는 '한국 실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영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아직 그런 원칙을 '우직하게' 지킨다.
푸르덴셜이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9262억원.국내 생보시장 점유율 1.7% 선이다.
2000년(0.5%)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의 성장이다.
흑자도 해마다 낸다.
2005 회계연도엔 1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국내에는 지금 ING 알리안츠 AIG PCA 등 11개 외국계 생보사가 영업 중이다.
대부분 외형과 내실을 착실하게 키우고 있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0조1455억원의 수입보험료(생명보험협회 통계)를 기록했다.
시장점유율 18.2%.외환위기 당시 1%대,2000년 5.8%,2002년 10.5%,2004년 16.5% 등 급성장 추세다.
네덜란드계 ING생명은 2000년 0.9%였던 시장점유율이 지금 4.8%로까지 높아졌다.
외국계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광기 금융감독원 검사1국장은 "1980년대 후반 후발 생보사가 등장하면서 생보시장의 경쟁이 심화했지만 외국계들은 위험 관리를 하면서 이익 중심으로 기반을 다졌다"고 말한다.
내실이 갖춰지면서 외형 성장도 탄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저축성 보험을 적게 판매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외국계는 책임준비금 가운데 연 7.5% 이상의 확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비중이 33%(2005년 3월 말 현재) 선이다.
반면 국내사는 이 비중이 57%에 이른다.
외국계의 금리 부담이 훨씬 가볍다는 얘기다.
외국계들은 이를 무기로 높은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보장금리)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어 보통 유리한 게 아니다.
국내 대형 A사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은 3.75%.이에 반해 ING생명은 4.25%를 적용한다.
A사의 보험료 수준이 100이라면 ING생명은 85∼90 수준이다.
대신 사업비는 더 많이 쓴다.
종신보험 상품의 평균 사업비가 100이라면 외국계는 113∼118 수준으로 훨씬 높다.
높은 사업비는 우수한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데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실제 능력을 갖춘 대졸 남성을 집중 채용한다.
국내사의 남성 설계사 비중은 10%를 밑돌지만 ING 푸르덴셜 등 일부 외국계의 경우 80%를 웃돈다.
조직 관리도 차이가 난다.
외국계는 지점 내에 영업조직을 둬 조직을 슬림화한다.
신규 계약에 대해 초기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제도도 국내사와는 다르다.
중도 해약이 일정 비율을 넘을 땐 모집수수료를 환수하는 등 차별화한 계약관리 정책도 폈다.
결국 이를 통해 설계사 정착률을 높였다.
그 결과 외국계 생보사의 설계사들은 생산성과 월 평균 소득면에서 국내사의 설계사를 압도한다.
이것이 다시 우량계약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는 셈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