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5:50
수정2006.04.03 05:52
< '그레이스 리 프로젝트'의 리 감독 인터뷰 >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짐작 정도만 하고 있겠지만 사실 아시아계 미국 여성 중에서 '그레이스 리'(Grace Lee)라는 이름은 한국에서는 김정은이나 이은주 정도로 흔하다.
이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국에서만 2천명을 넘을 정도로 많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와이드 앵글 섹션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는 '그레이스 리 프로젝트'(The Grace Lee Project)의 그레이스 리(37) 감독도 이들 중 한 명이다.
어릴 적부터 "내 친구 중에도 그레이스 리가 있었는데…"라는 말을 지겹게도 많이 들었던 그녀, 마침 "그레이스 리라고 하면 한결같이 착하고 조용하고 침착하며 내성적일 것 같다"는 사람들의 선입관이 짜증이 날 때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보기로 한다.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Gracelee.net)를 만드는 것. 사이트에 접속한 전세계 그레이스 리들의 숫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제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직접 이들을 만나러 나선다.
부산영화제의 단골 초청자 그레이스 리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독특한 제목의 영화 '그레이스 리 프로젝트'로 세번째 부산을 방문했다.
"어려서부터 항상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해왔다"며 스스로의 반골 기질을 설명하는 그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레이스 리'라고 하면 드는 선입관들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일단 제작의 동력이 된 것은 이름을 둘러싼 선입관들이 진짜인지에 대한 흥미. "그렇게 대단한 편견은 아니지만 선입관이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이 프로젝트를 자극했다.
"수많은 '그레이스 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었다"는 설명이 덧붙여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흔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은총'이라는 그레이스의 기독교적 의미와 미국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이미지가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면 하는 부모들의 바람과 우아한 서구인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이상이 묻어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그녀가 만난 사람들은 방송국 기자에서부터 사회 운동가, 중산층의 틴에이저, 독실한 기독교 신자, 한국에서 사는 레즈비언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을 통해 감독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레이스 리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들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들 이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민자 2세인 리 감독은 2002년 미국 잡지 필름메이커가 뽑는 '촉망받는 영화 감독 25인'에 포함될 정도로 현지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호장막', '최고의 부르스트' 등의 단편을 만들었던 그녀는 장편 데뷔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한국 영화사에 의해 제작이 발표됐다가 현재 보류 중인 영화 '버터 냄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다.
"코리안 아메리칸이지만 남들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내가 남과 다른 것을 쉽게 긍정했다"고 설명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와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타자의 존재"라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절반씩 섞여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비수기 영화계 구원투수 '나야 나'…'하이재킹'vs'핸섬가이즈'vs'탈주' [김예랑의 영화랑]](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34983.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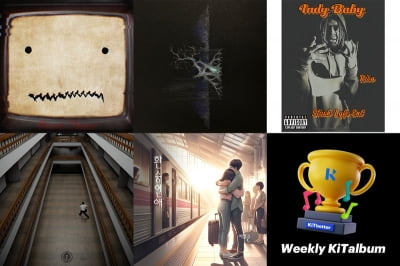
![[포토] 수피아 카야, '깜찍하게 하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3.37036065.3.jpg)











![[신간] 이더리움의 탄생 비화…'이더리움 억만장자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704147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