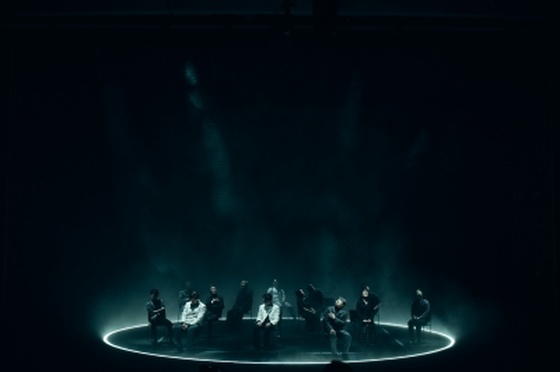입력2006.04.03 05:10
수정2006.04.03 05:11
우울증 등 정신병과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병의 치료에 일대 전기가 될 기반이론이 재미 한국인 과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필라델피아 위스타 연구소(Wistar Institute)의 이민규(37) 박사는 `BHC110'이란 효소가 인체 내에서 특정 단백질 복합체와 결합해 신경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세포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자들은 이 BHC110의 신경관련 유전자의 발현 억제 활동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경우 각종 정신병과 뇌신경 질환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BHC110의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이 효소를 약물로 조정해 신경정신질환들의 근원을 막는 연구에 큰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BHC110은 DNA와 결합하는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histone)에서 메틸 성분을 떼내는 탈(脫)메틸화(demethylation)란 핵심 작용을 통해 신경계통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HC110의 탈메틸화 작용이 실제 사람의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큰 의문점으로 꼽혀왔다.
이 박사팀은 세포 실험을 통해 BHC110이 인체 내에서 `BHC'란 단백질 복합체에 섞여 탈메틸화 작용을 하게 되며 특히 BHC 복합체 중 CoREST란 단백질이 실제 탈 메틸화를 촉발시키는 주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박사는 "사람 세포 안에서 BHC110 효소가 작동하는 구체적 원리를 알아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 효소 활동을 낮추거나 높이는 약물을 개발해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등 난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박사는 "BHC110 효소가 제어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신경정신질환 발병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는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런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혀내는 것도 향후 치료제 개발의 주요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 박사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인터넷판에 지난 달 발표된 데 이어 9월15일자 본지에도 실렸다.
이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에서 생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4년부터 위스타 연구소의 유전자 발현 및 조절 연구분과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