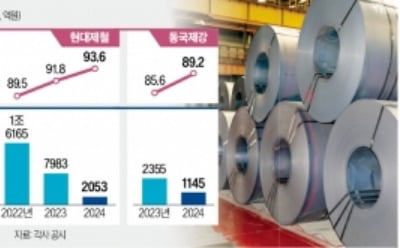재경부-산자부, 국가 미래전략 충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이 어떻게 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 1만달러대의 중진국에서 벗어나 2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이 정부 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선진통상국가' 개념을 도입,범 정부 차원에서 국가 발전 아젠다로 채택한 마당에 산업자원부는 이보다 '선진산업강국'이 낫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특히 산자부는 재경부의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 강소국 모델을 따라 선진형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오히려 수출 1위인 제조업 강국 독일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20일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 대응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4월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선진통상국가'를 국가 발전모델로 제시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재경부가 주도한 대외경제위원회는 당시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서비스,부품·소재,정보기술(IT) 분야 육성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확대 △개방친화적 사회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자영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고,하반기엔 법률 의료 교육 회계 등 10개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달한 반면 서비스부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부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최근 제조업 비중이 1만달러 진입기보다 더욱 높아졌고 △제조업 성장기여도가 70%를 차지하며 △일부 제조업은 생산성이 선진국의 50% 수준에 그쳐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많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자부는 서비스업 발전모델로는 금융 부문에서 미국 영국을,물류 부문에서 네덜란드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