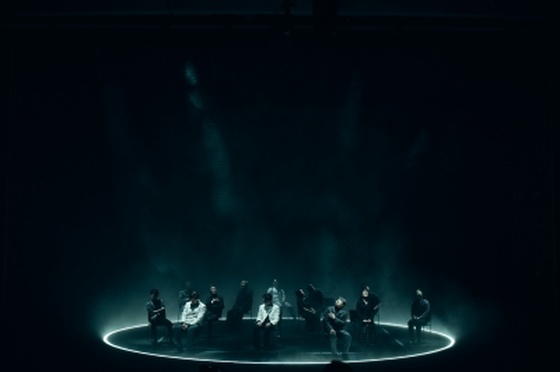입력2006.04.01 22:02
수정2006.04.01 22:03
롯데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잇따라 터져나오는 비자금 사건에 대형 건설업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경영진 조사에서 그룹 계열의 건설업체는 집중적인 타깃이되고 있고 대우건설의 경우 그룹 계열이 아닌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많은 업종중 이처럼 건설업체가 비자금 조성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자 그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꼽히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비자금 조성이 너무도 쉽다는 점이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원가경쟁력이 생명이어서 단돈 10원이라도 철저하게 장부에기재하고 그 변동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가 이뤄져 비자금 조성이 꽤나힘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건설업체는 전국에 수십, 수백개의 공사현장이 있고 개별 공사마다 수십개의 하도급업체가 생겨나는데다 각 공사마다 자재나 설비의 조달원가가 제각기 다를 수 있어 투명한 원가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여의도 트럼프월드처럼 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는 아파트나 주상복합 공사의 경우 분양만 성공하면 수십억, 수백억원의 '대박'을 터뜨릴 수있어 공사원가관리는 소홀히 되기 십상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경영진이나 현장소장들이 하도급업체에 압력을 넣어 조달원가를 조작, 비자금을 조성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옛날에는 그룹 계열의 유통업체나 상사를 통해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수년간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건설업계에여유자금이 많자 창구가 건설쪽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런 풍토를 악용해 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오너나 경영진에 있지만 건설업과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이루려는 일부 정치권과 공무원, 학계등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전국 46개 건설현장의 소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소장의 73%가 금품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고 공사액의 0.54%를 접대나 상납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경험한 현장소장은 50%에 달했고 불이익 내용은대금 늑장지급, 규제강화, 공사일정 지연, 잦은 공문 발송 등 가지각색이었다.
대형건설업체의 한 주택영업 담당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십억원의 손해가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나 관련심의를 맡은 인사들에게 '급행료' 성격의 뒷돈을건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인허가 규제의 압력을 덜 받는 제조업체는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면서도 공기에쫓겨 공사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하는 건설업의 속성은 철저하게 이용하는 '악어새'들에도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건설업계의 비자금 조성은 일종의 구조적문제점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번 수사가 부패 사슬고리를 끊고 투명경영과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