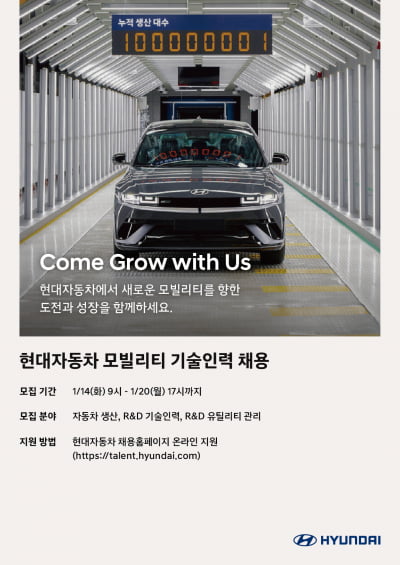미국 자동차업계에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틈새 모델'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대규모 인센티브와 할인 전략이 한계에 부딪치자 '다품종 소량생산'인 이른바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ation)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를 중심으로 '승용차와 같은 SUV(레저용차량)' '미니밴보다 작은 마이크로밴' 등 과거에 없던 신 모델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메릴린치의 분석을 인용,미국의 신차 출시가 지난해 32건에서 올해는 3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6년에는 73건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델별 평균수명도 10년 전 4년에서 2006년에는 2.2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라이슬러의 최신 모델인 '퍼시피카'가 그 대표적 예다.
SUV와 미니밴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이 차량은 스포티한 가족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타깃이다.
GM은 SUV 수요를 싹쓸이 하기 위해 초대형 H2,이보다 약간 작은 H3(2006년 출시 예정),고급용 캐딜락에스컬레이드,작고 약간 싼 뷰익 레이니어(이상 내년 출시 예정)를 선보인다.
포드도 향후 5년 안에 무려 65종의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마케팅과 옵션에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적용되고 있다.
'나만의 특별한 것'을 원하는 Y세대를 겨냥,'사이언'을 출시한 도요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이 차를 팔고 광고도 웹사이트와 낙서 순회쇼를 통해서만 한다.
Y세대는 '아무나 타는 차'를 싫어한다는 판단에서다.
형광 컵홀더,10가지 색깔로 변하는 6CD체인저 플레이어 등 인테리어 옵션도 다양하다.
포드가 '대량생산'체제를 도입한 지 1백년 만에 미 업계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략을 바꾼 것은 "차를 사게 만드는 동력이 가격,광고,경제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과 신선한 스타일"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같은 전략을 도입,신차 개발과 생산 경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인텔·엔비디아 정조준한 AMD, 'AI PC' 관련 신제품 대거 공개 [CES 2025]](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124837.3.jpg)
![AI주 강세에 나스닥 1.24% 상승…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모닝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A.3906110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