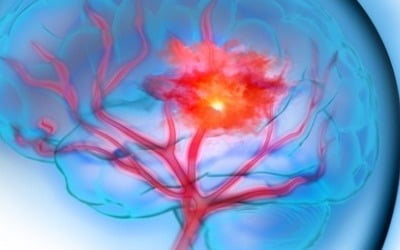홍신선씨 여섯번째 시집 '자화상을 위하여' 출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신선씨의 여섯번째 시집 ''자화상을 위하여''(세계사)는 한류와 난류의 교차수역처럼 차갑고 또 따뜻하다.
이번 시집은 거꾸로 돌아가는 영사기처럼 지난해부터 1996년까지 세월을 거슬러가는 방식으로 구성돼있다.
세기말의 언덕을 오르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중년의 삶이 큰 구릉을 형성하고 골짜기 사이로 황량한 현실이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의 말처럼 ''하릴없이 농경문화세대의 맨 후미에 처져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사회를 힘겹게 통과해온 흠집많은 나를 발견하고 싫든 좋든 IT사회의 변두리에까지 떠밀려온'' 세대의 틈바구니 인생이 군더더기 없이 펼쳐진다.
그 황폐한 배경 위에 ''내면 속으로 떠도는 섬들''의 풍경이 오롯하게 떠오르는데 ''섬''들의 바탕은 그냥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물결이다.
그 중에서도 뒷부분에 실린 ''마음경'' 연작은 겨울 물살에 튕겨 빛나는 햇볕처럼 신선하다.
''꽉 딛고 선 발밑이 힘쓸 수 없게 뭉텅뭉텅 패어 나가는'' 20세기 시간의 급류 속에서도 그는 ''손톱만한'' 생명의 싹을 발견한다.
''밭고랑에 종자감자를 묻는다/이제 머지않아 산 것들의 아랫배 속에 든/씨부처가/배냇짓처럼 가만가만 발길질을/머리통 들이받는 산통을/시작하리라/비로소 석유심지 끝에 빨갛게 앉는 불똥만한,/푸른 하늘가에 끌려나와/궤좌한/손톱만한 감자싹을/나를 보리라''(''마음경·20''부분)
시인이 관조와 사색의 들판에 파종하는 씨앗은 스스로 다짐하는 희망의 거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의 발길은 세속도시와 황폐한 역사의 터널을 지나 유년의 볍씨가 자라는 고향으로 가닿는다.
''내 시골로 돌아가 살리/새로 핀 앵두꽃들로 세상을 환하게 갈아입히며/또는 폐정 속 아직도 깊은 밑바닥에서 울렁이는 관능들을/서리서리 또아리 튼 새벽 물빛들을 길으며/시골에 살리''하고 노래한다.
또 하나.
40년 가까운 시력(詩歷)에서 빚어올린 ''잘 익은 에로티시즘의 미학''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암나사의 터진 밑구멍 속으로/한 입씩 옴찔옴찔 무는 탱탱한 질 속으로/빈틈없이 삽입해 들어간/수나사의/성난 살 한 토막//폐품이 된 이앙기에서 쏟아져 나온/나사 한 쌍/외설한 체위 들킨 채 날흙 속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둘레에는/정액 쏟듯 흘린/제비꽃 몇 방울''(''봄날''전문)
봄날의 생명력을 재생과 분출의 이미지로 뽑아올린 수작이다.
''끔찍한 집착''과 ''편안한 망각''의 굴곡을 건넌 뒤에 시인이 발견한 ''날흙''의 생명 세상이 그곳에서 꽃을 피운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