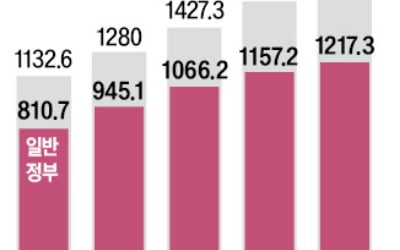[광고의 세계] (8) '광고는 물건 팔기 위한 상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고를 상술이라고들 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광고인들은 온갖 술책을 동원하는 장사꾼의 앞잡이쯤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광고인은 한사람도 없다.
광고는 제품의 장점을 과장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던 원초적인 상술의 개념을 넘어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이제 전파를 타는 순간 대중들사이에 소통되는 새로운 언어와 생활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절정의 개그 프로그램인 "OO콘써트"를 틀어보자.
숱한 개그맨들이 각종 광고의 카피와 상황들을 활용한 개그를 쏟아낸다.
"아깝다 청춘!남자역할도 못해보고""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엉엉"등은 모두 광고속의 특정 내용을 적당히 각색한 것들이다.
대부분 시청자들은 그 패러디를 정확히 알아듣고 즐거워한다.
광고 카피는 젊은 세대에겐 일상 생활에서 새로운 의사소통의 코드이기도 하다.
지난 수능시험장으로 돌아가보자.
"유쾌,상쾌,통쾌.내가패스!"라는 광고패러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 "헵번스타일"이란 새로운 패션양식을 부산물로 탄생시켰듯 광고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활양식이 부산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예전엔 광고만 나오면 가차없이 채널을 돌리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잘나가는 생활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광고를 "관찰"하는 결과를 낳고도 있다.
광고는 대중문화다.
광고인들은 "상술"이 아닌 "상도(商道)"로서의 전문가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중도 마찬가지다.
광고인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다.
광고를 대중문화의 한 양식으로 인정하고 조언할때 "상술로서의 광고"가 "문화로서의 광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제일기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해익
![[포토] 캐리비안베이서 북유럽 감성 노천탕 즐겨볼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AA.3892392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