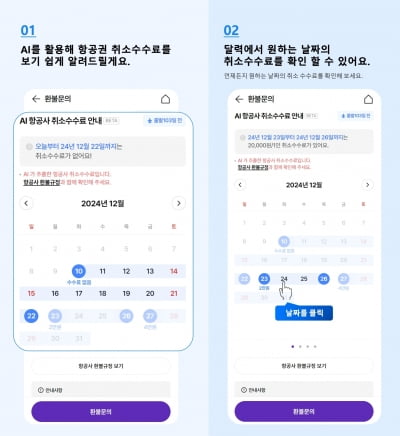나는 클릭한다 고로 존재한다..이원 시집 '야후!의 강물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잉크 냄새가 밴 조간신문을 펼치는 대신 새벽에/무향의 인터넷을 가볍게 따닥 클릭한다/신문지면을 인쇄한 모습 그대로/보여주는 PDF서비스를 클릭한다/코스닥 이젠 날개가 없다/단기외채 총5백억달러/클릭을 할 때마다 신문이 한 면씩 넘어간다/나는 세계를 연속 클릭한다/클릭 한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한 세계가 일어선다"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중)
젊은 시인 이원(33)의 두 번째 시집 '야후!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뜬다'(문학과 지성사)는 디지털 문화의 삶속에서 존재의 현주소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시집 곳곳에는 '전자사막'을 떠도는 고독한 유목민의 운명이 낯선 언어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채색돼 나타난다.
시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웹에서 전자신문을 서핑한데 이어 '나'를 입력한 상황을 그려낸다.
'검색어 나에 대한 검색 결과로/0개의 카테고리와 177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나는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나는 나를 찾아 차례대로 클릭한다/…/계속해서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클릭함으로써 존재하지만 나의 실체는 가상공간 어디에도 없다.
다만 내 현존이 '기계들에 기숙'하고 있으며 '오래전 저장된 게임'일 수도,'진공포장돼 장기 보존되고 있는' 자료일 수도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인터넷상의 주소는 '허공속의 주소'이고 웹브라우저는 세상을 향한 '창'이 아니라 때때로 나를 가두는 '벽'이다.
시 '나는 검색사이트 안에 있지 않고 모니터 앞에 있다'가 그 증거다.
'애기동자꽃의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그곳에서 나는 갑자기 멈추어 선다 막힌 세계/너머에는 광활한 신대륙이 펼쳐지고 있겠지만 창은/금방 벽이 되어 내 앞에 선다'
그러나 시인은 슬픔이나 통증을 즉각 토해내지 않는다.
그의 신경은 몸을 떠나 하드디스크에 이식돼 있기 때문이다.
'한낮 하드디스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나는 내 그림자를 바이러스처럼 물끄러미 들여다본다/…/나는 내 그림자의 신경망을 잘라내어/한낮 하드 디스크 구석에 심는다(나는 신경망을 심는다)'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세상도 사막처럼 삭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목잘린 불상과 금칠 벗겨진 십자가,그물에 걸린 신들의 이미지가 도처에 넘쳐난다.
엘리베이터안에선 사방의 벽에 내가 복제되고 모니터가 내 눈을 대체한다.
극장안에는 불안이 끓는 물처럼 출렁거리고 패스트푸드점에는 신형칩으로 갈아끼워진 공기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나는 내 몸을 켠 채 나를 전송해주는 휴대폰을 들고 지하철순환선에 올라탄다.
이 비정성시(非情成市)에서 사람들은 정주할 수 없는 자동차로 변한다.
시인은 말한다.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뿌리가 없었다.
죽을 때까지 두 다리로 지상에서 걸어다니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겠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