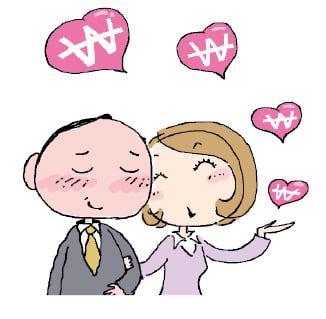대우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중 하나가 대우채 후유증이다.
99년 '8.12 환매연기조치'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환매연기 조치나 대우채 과다편입으로 인한 후유증이 2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감자다.
투자자들과 증권(판매회사).투신사 간의 분쟁이 속출해 법원에 계류중인 대우채 송사만 10건을 훨씬 웃돈다.
환매연기 당시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규모가 1백10조원(대우채는 18조9천억원)에 달해 파장은 의외로 길다.
더욱이 금감위 사람들은 일일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행정지침의 정당성, 불법성 등을 놓고 확인서를 쓰느라 요즘 더욱 분주하다.
공무원이란 원래 그런 신분이다.
확인서를 쓴 사람들중 일부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민간기업의 전임자들과는 처지가 다르다.
감사원은 대우감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들려오는 얘기론는 금감위 금감원 당국자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는 정도다.
사법부는 우선 환매연기 조치는 '적법', 약관을 위반한 대우채 과다편입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잇달아 대우채 환매연기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증권사 손을 들어줬다.
종목당 편입한도(10%)를 어겨 대우채를 과다편입한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이 모두 투자자 편을 들었다.
증권.투신사가 명문화된 약관이나 법규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법이고 이로 인한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투신사의 선관의무 소홀에 대해선 상반된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편입채권을 이 펀드, 저 펀드로 옮기는 이른바 "펀드 물타기"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묻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는 감독기관의 창구지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투신사만 탓할 수는 없다는 요지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21부는 투자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상급법원(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아직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곳은 없다.
당국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아직 눈치볼 일이 많다는 얘기다.
대우사태 이후 관치의 깃발이 더욱 펄럭이고 있으니...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 글자크기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글자행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공유하기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