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50
수정2006.04.01 23:52
주5일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급류를 타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합의서에는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회의록에 생활수준은 임금수준을 의미한다고 부기했다.
따라서 일단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은 기업들이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또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때 실근로시간을 함께 줄일 것인지, 시간당 임금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임금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제 아래에서 근로자 B의 시간당 임금이 5천원이고, 주당 실근로시간이 45.9시간이라고 할 때 B의 주당 임금은 23만4천250원(44시간X5천원=1.9X(5천원+2천500원))이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B의 주당 실근로시간을 법정시간 단축분(4시간) 만큼 줄여 41.9시간이 되게 하고 시간당 임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주당 임금은 21만4천250원으로 8.5% 삭감된다.
반면 주당 실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 초과근로시간을 5.9시간으로 늘리고 시간당 임금을 현행대로 둔다면 B의 임금은 24만4천250원으로 4.3% 증가한다.
경영계가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당장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을 보전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다만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의 보전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 보다는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 때처럼 행정지도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분 임금의 보전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을 보전한다는 원칙은 서 있지만 결국 개별 사업장별로 실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

!["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살'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45349.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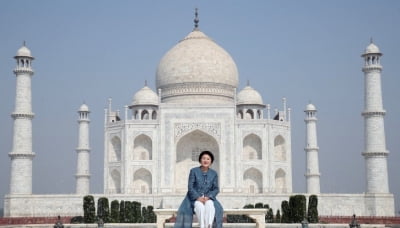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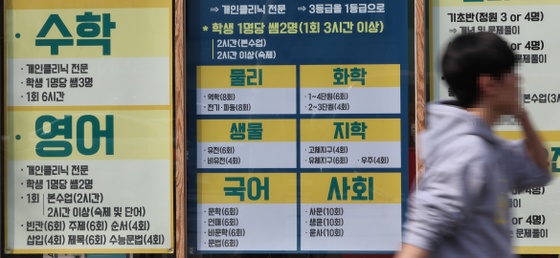

![고용보고서 앞두고 혼조 마감…엔비디아, 시총 3위로 밀려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438444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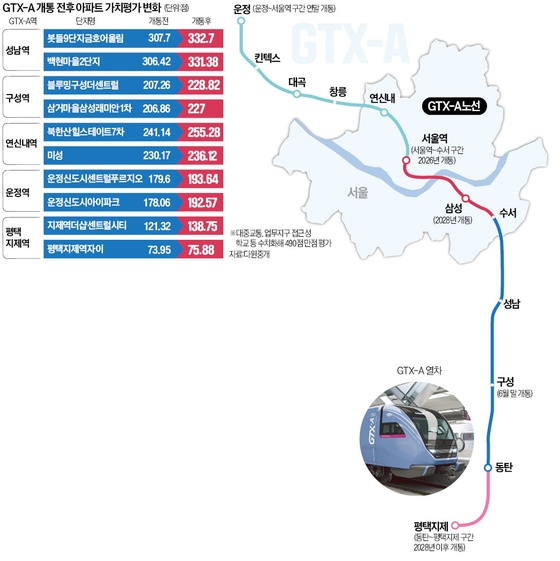







![[베스트셀러] 서점가도 푸바오앓이…'전지적 푸바오 시점' 단숨에 1위](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ZK.36959892.3.jpg)